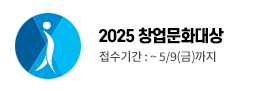이 총리의 지적처럼 영세상인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퇴직 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또는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게 된 비자발적 생계형이 상당수다. 1인당 연소득은 기껏해야 1,60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8,000만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있다. 열악한 처지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폭탄까지 안겼으니 재앙이 따로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자영업자를 둘러싼 각종 수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프집·간이주점·식료품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창업을 앞지르기도 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폐업률이 90%를 넘고 문 닫는 점포 수도 100만개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는 것이 가맹비와 임대료·카드수수료 같은 대기업과 건물주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리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렷이 보여준다. 정부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에 나서야 마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