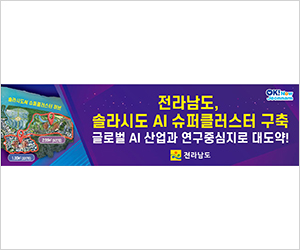선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자체 간 경쟁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4곳이 한꺼번에 신청한 충청권에서는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 후유증이 걱정될 정도다. 국가산단의 선정 목적은 기간산업과 첨단 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지방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무작정 늘려서는 곤란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계속 지정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산단은 이미 44곳에 이른다.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65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7개, 농공산업단지 468개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가 1,200개에 육박한다. 유치산업도 의료·바이오·헬스케어·신소재 등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번에 산단 신청을 한 지역들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복투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가산단 조성에는 기반시설 등에 적어도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산단을 늘렸다가는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가동 중인 상당수의 산단이 불황으로 휴폐업 공장이 늘어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8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산단 재생 등 산단 환골탈태에 6,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금은 공약이행에 매달려 국가산단을 무리하게 늘릴 때가 아니다. 기존 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해도 늦지 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