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모토는 ‘친(親)소비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쟁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쏟아냈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이라는 조직까지 신설했다. 올해 초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소비자(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늘려 시장을 키우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겠다며 개인을 코스닥에 붙잡아놓았기 때문이다.
잔류의 대가는 혹독하다. 올해 코스닥지수는 20% 이상 하락했고 개인은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반대매매 탓에 증권사에 빼앗기듯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미중 무역분쟁 탓이 크다지만 ‘코스닥 활성화 원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빚(신용융자)을 내서 투자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먼저 기대감을 조성한 쪽은 정부다. 최소한 소비자 정책으로서의 코스닥 활성화는 낙제점이다.
정부는 코스닥 체질 개선을 공언했지만 이번 급락장에 대한 대처를 보면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도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증시 패닉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과의 괴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코스닥이야말로 늘 펀더멘털이 논란이 되는 곳이다. 시장을 이끄는 바이오는 기대감을 안고 산다.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기준을 완화한 것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 본질은 그대로다. 새 먹거리가 될 때까지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불어온 한류 덕에 떠오른 미디어·엔터테인먼트주도 고평가 논란이 반복된다. 그래서 기업 한 곳의 악재, 부정적 보고서 한 편에 업종 전체가 휘청인다. 이것이 1,000을 바라봤던 코스닥의 현실이다. 결국 저질 체력은 그대로 방치한 주가 부양책은 개미의 곡소리로 돌아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뜬금없는 사모펀드 활성화, 기업공개(IPO) 개선 등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2’를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우선인 코스닥 활성화는 간판(코스닥)만 바꿔 단 중소기업 지원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본시장을 기업 지원의 ‘도구’로 보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증시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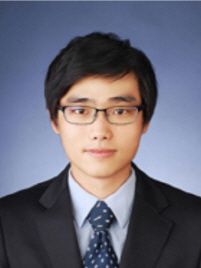
 mryesandno@sedaily.com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