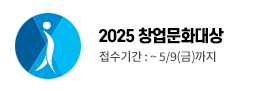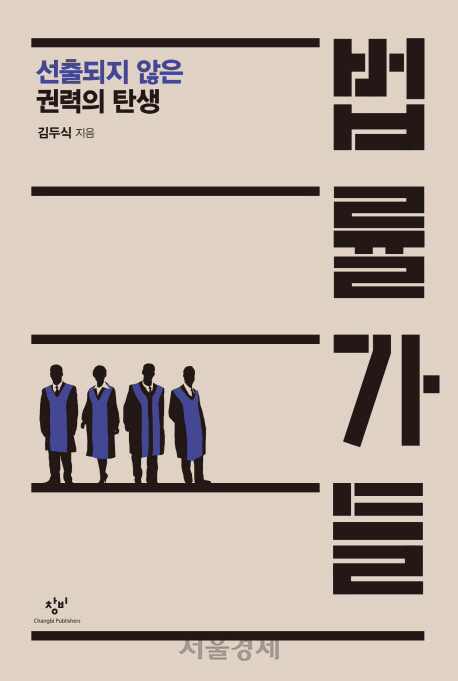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9년 법조계의 병폐와 모순을 파헤친 책을 내면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검사 출신인 김 교수가 보기에 법조계는 마치 피가 섞인 가족처럼 단단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이었다. 용기 있는 한 지식인의 통렬한 내부 고발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김 교수는 일약 ‘스타 학자’로 부상했다.
‘법률가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은 이런 김 교수가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한국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한 저서다. 69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법조 엘리트’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서술한다.
김 교수는 우선 신문 기사와 저작, 판결문과 공소장 등 각종 자료를 망라해 광복 이후부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5월16일까지 3,000명의 법률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창기 법조 사회를 형성한 원로 법률가를 5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1그룹에는 일제시대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인물들이 속하며 2그룹은 1922년부터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을 포함한다. 일제 강점기에 서기 겸 통역관으로 일하다 판사와 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이 3그룹, 해방 이후 국가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이들이 4그룹으로 분류됐다. 김 교수는 법조계 최대 스캔들이자 4그룹에 해당하는 ‘이법회’(以法會)의 명단도 최초로 공개한다.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은 8월14일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다음날 갑작스러운 광복으로 시험 감독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200명 가량의 응시생들이 ‘이법회’를 조직해서 합격증을 받아냈다.
막강한 권한으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한 ‘신성가족’의 뿌리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복원한 김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책을 맺는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 전반적으로 그런 시대였고 어느 누구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3만원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