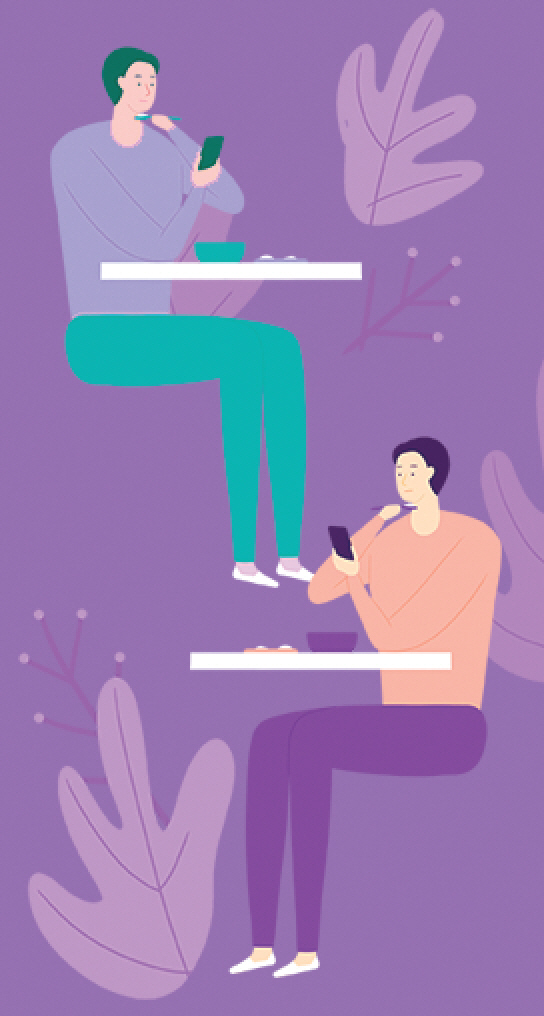바쁘다는 핑계로
서두르며 뱉던 말
그냥 헤어지기 섭섭해
무성했던 말치레
언제 밥 한번 먹자
수없이 오가던 가로수 길
이팝나무 고봉으로 피고 졌어도
잊고 지나쳤던 그 길에
조등 하나 켜졌다
낯선 얼굴 틈에 끼어서
눈시울 붉혀가며 떠 넣는
빛바랜 약속
너는 거기서, 나는 여기서
때 늦은 밥을 먹는다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食口라 한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 친해진다. 친구를 뜻하는 영어 companion의 라틴어 어원도 ‘함께 빵을 먹는 사람’에서 유래한 걸 보면 동서고금의 인지상정인 모양이다. 연말은 소원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기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의 ‘언제’가 이 시기에 밀려 있다. 반가움과 아쉬움 속에 거리는 왁자지껄하다. 아무리 챙겨도 ‘때 늦은 밥’이야 인력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밥 한 번 먹자! <시인 반칠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