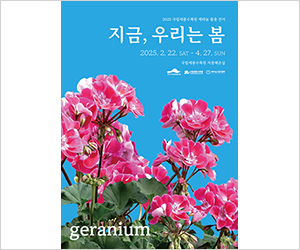이맘때 지방 출장을 다니다 보면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붉은 홍시가 시골 정취를 더욱 정겹게 만든다. 홍시가 매달려 있는 감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할머니께서 주머니 속 곶감을 남몰래 내 손에 쥐여주시던 추억이 떠오른다. 먹을 것이 귀했던 어린 시절 눈물 나게 맛있던 그 곶감이 지금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소득품목인 ‘떫은 감’이 곶감·반건시·감말랭이 등으로 변신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1년 전인 지난 2008년 곶감류 수출은 31만달러로 미미했으나 2017년 11월 기준 이미 280만달러를 달성했고 지난해 말까지 400만달러를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사이 열세 배에 달하는 수출 증가는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성장이다. 수출 확대로 ‘떫은 감’은 임업인의 대표적인 효자 소득품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수출이 저절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떫은 감 생산량이 과거 10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판로 확대가 절박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적극적인 해외 홍보·판촉과 해외 냉동·냉장물류 등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홍콩 등 선진국뿐 아니라 베트남·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고급 건강간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곶감의 뒤를 이을 히트 상품으로 ‘대추’의 성장이 주목된다. 10년 전만 해도 전무하다시피 했던 대추 수출이 2017년 11월 기준 62만달러를 달성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0년 후 감히 곶감과 같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해본다.
지난해에는 건대추뿐 아니라 생대추 수출에도 도전해 일본·베트남 등 해외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했다. 생대추 수출은 홍수 출하기에 소비를 분산시켜 대추가격 지지에 효과가 높아 임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곶감은 물론 대추 수출 성공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농가와 수출 업체들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들로 구성된 자율단체인 ‘수출협의회’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최된 ‘임산물 수출 확대 전략 워크숍’에서 그분들의 생생한 수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들은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과 그간의 시장개척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해외시장에 진출했는지 담담하면서도 열정을 담아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 및 제조 업체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임산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산림청의 수출 지원 정책과 예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듣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Oldies but Goodies)’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할머니의 곶감, 제사상에 오르던 대추 같은 전통식품이 세계인의 건강간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2, 제3의 곶감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세계에 선보이는 데 민관이 손을 맞잡고 더욱 힘을 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