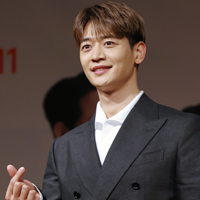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1일 합의한 90일 무역 휴전 협상이 15일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달 말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둔 중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긴급한 현안에서 합의를 이루며 양국 간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미국 내 대중 강경파가 중국의 대미 무역지표를 빌미로 목소리를 높일 경우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국적기업의 중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제한 등 미국이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해온 중국의 비무역장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반전으로 돌입하는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233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1.3% 늘었지만 수입은 0.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9.9%, 수입은 그보다 월등히 높은 15.8%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전년 비 16.2% 줄어든 3,517억6,000만달러에 그쳐 지난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4.4%, -7.6%를 기록하며 2016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자 해관총서는 “중국의 무역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둔화와 맞물린 중국 무역지표 악화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타결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3월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선포한 후에도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시종일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중 관세 압박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매파’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 금융당국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 신용카드사들의 위안화 결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차기 협상에서 미국 측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6월 외국사들이 위안화 청산 결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 9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고시했으나, 그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신청한 사업 승인을 1년 이상 미루고 있다. FT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1월 50대50 합작 조건으로 위안화 결제 사업 승인을 받은 반면 비자·마스터는 중국 당국에서 요구하는 합작방식을 따르지 않아 미운털이 박힌 것이라고 풀이하며,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현지사업 처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WSJ는 1990년대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미디어사 비아콤이 중국 정부의 방해를 이유로 현지사업 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버·휴렛팩커드(HP)·맥도날드에 이어 비아콤마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호소함에 따라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배척이 확산되는 점도 양국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다. 지난주 폴란드 정보기관이 화웨이의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폴란드 사이버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미국발 화웨이 봉쇄가 유럽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14일 사평에서 “지난주 폴란드 정보기관이 화웨이 간부 체포 소식을 전하고 이를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무부가 리트윗했다”며 “미국은 중국 회사가 경쟁에서 앞서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