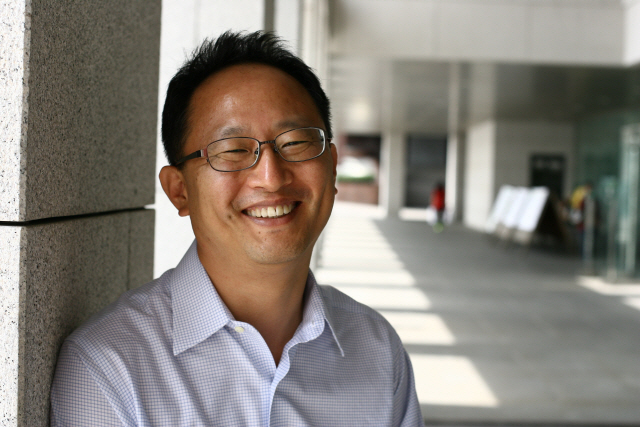맹자는 간혹 ‘논어’에 나오지 않은 공자의 말을 전한다. 의아스럽게도 그중 공자가 분노를 품은 채 저주를 하는 문장이 있다. “처음으로 사람 인형을 만든 사람은 후사가 없으리라(시작용자 기무후호·始作俑者 其無後乎).”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장례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더라도 현세와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여겼다. 왕족의 경우 무덤을 지하궁전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의 생활을 지하에 재현했다. 이 때문에 왕족과 귀족의 무덤을 발굴해보면 무덤 주인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뼈 및 그릇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릇은 죽은 사람이 지하 세계에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도구이고 동물은 이동을 도와주고 사람은 시중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해 무덤에 부장됐다. 이러한 장례를 순장제라고 한다.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순장은 인간의 존엄을 돌보지 않은 잔인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사후에도 생전과 유사한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의 권력을 지하의 궁전으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진 헌공이 기원전 384년 순장제를 폐지한 것을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순장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맹자가 전하는 공자의 말을 보면 순장제가 폐지될 때 순장 풍습이 일시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단서가 바로 용(俑)이다. 용은 사람의 꼴을 닮은 인형을 가리킨다. 이 인형을 나무로 만들면 목용(木俑)이 되고 진흙으로 만들면 도용(陶俑)이 된다. 이러한 실례는 중국 시
안의 진시황 병마용갱에서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군의 병사가 열과 오를 맞추고 무덤의 주인 진시황을 지키기 위해 도열해 있는 모습은 지금도 걸어 움직일 듯한 착각을 하게 할 정도로 정교하다.
공자는 산 사람을 희생시키는 순장제를 대체하는 사람 인형을 만든 사람에게 왜 저주를 퍼부었을까. 사람 인형이 실제 사람의 희생을 대체했으므로 창의성을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는 맹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맹자는 백성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된 양나라 혜왕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했다. 이에 그는 혜왕에게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거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혜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살인 도구가 다르더라도 사람을 죽인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전쟁에서 오십 걸음 도망가나 백 걸음 도망가나 차이가 없다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고사를 연상시킨다. 이제 공자의 저주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 인형은 사람의 희생을 대체했다고 하지만 순장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즉 순장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면 순장의 기억까지 완전히 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람 인형은 순장의 기억을 계속 되살릴 수 있고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순장제와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공자의 말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제도에 대한 공분을 느낄 수 있다. 이 공분은 근대의 인권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우리는 인권이 제도로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고대의 순장제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거나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남성 아이돌의 몇몇 스타는 팬의 사랑에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하지만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정치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의 의미를 막말과 망언으로 조롱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시적이거나 극소수에 한정되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언행이 반복되면 우리가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후사가 없으리라”는 공분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