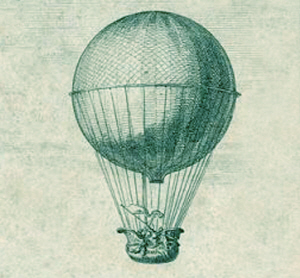1783년 8월 프랑스 파리의 샹드마르스 광장에 40만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프랑스 발명가 쟈크 알렉상드르 세자르 샤를과 로베르트 형제가 수소를 채워 만든 열기구가 하늘 높이 뜨는 장관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인류 최초의 수소 열기구는 40분을 넘게 날아가 파리 북동쪽 고네스에서 21㎞ 떨어진 마을에 무사히 착륙했다. 당시 시골 주민들은 괴물이 습격했다며 교회로 급거 피신했고 돌멩이와 갈퀴를 들어 열기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수소는 인류의 비행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원소 중에 가장 가볍기 때문에 중량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아 에너지 소모가 많은 비행체의 동력원으로 적합하다.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이만큼 쓸모 있는 연료가 없는 셈이다. 수소기체 발견이 과학적인 비행의 역사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독일 페르디난트 그라프 폰 체펠린 백작은 1900년 조종이 가능한 수소가스 경식 비행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비행선은 알루미늄으로 골격을 만들고 두꺼운 천으로 감싼 뒤 여러 개의 수소가스 주머니를 집어넣어 ‘항행할 수 있는 풍선’이라는 특허까지 따냈다. 여기에 16마력의 발동기를 장착해 시속 20마일 속도로 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백전노장이 이끄는 건물만 한 기계가 중력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며 환호했다.
수소 비행체 개발에는 희생도 뒤따라야 했다. 1937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대서양 횡단비행에 나섰던 힌덴부르크호는 미국 착륙을 눈앞에 두고 잿더미로 변해 독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던 비행체는 착륙과정에서 수소가 가득한 기체에 불이 옮겨붙어 승객 3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다. 이후 수소는 위험물질로 분류됐고 열기구를 띄우는 연료로 수소 대신 헬륨을 사용해야만 했다.
최근 신기술 개발에 힘입어 수소를 이용한 비행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은 수소 엔진으로 날아가는 5인승 비행 차량을 만들어 화물 운송이나 항공 구급차로 투입할 예정이다. 보잉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행기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수소 비행체가 안전성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상범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