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개념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의 해군 장교 출신인 구르프리트 쿠라나 박사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와 태평양의 결합은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 역동적 커플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인도·태평양’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 전략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 명칭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다. 미국·일본·인도의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와 지난달 일본에서 각각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 요구도 마냥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수십 년 운명을 결정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김광덕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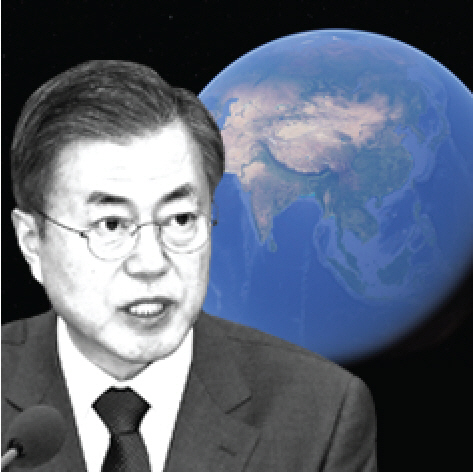
 kdkim@sedaily.com
kd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