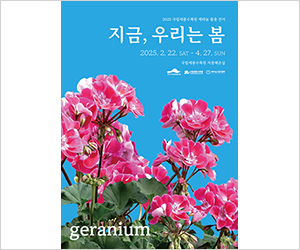청와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일본의 조치가 ‘과잉 대응’이었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중국 감싸기’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 등을 포함한 입국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맞대응이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 빗장을 건 다른 나라를 놔두고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면서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방역을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에서는 18만8,518명이 진단 검사를 마친 반면 일본의 검사 건수는 8,029명에 불과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선을 넘은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면서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가 주권 국가로서 마땅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유학생 1만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한국이 절제된 대응을 했다는 근거로 ‘특별입국절차’를 꼽았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거론하며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중국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