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눈은 빠른 속도로 실내를 스캐닝한 후 탐지된 정보를 뇌로 보낸다. 창가 빈자리를 발견했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곧바로 환호하면서 어서 가서 자리를 차지하라고 명령한다. 이때 옆자리까지 비어 있다면 우리 뇌는 더욱 즐거워한다. 왜 그럴까.
‘공간의 심리학’ 저자인 독일 작가 발터 슈미트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심리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뼛속 깊이 새겨진 진화 심리, 환경 심리가 여러 종류의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를 경계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에 따르면 창가 선호 현상은 비단 카페나 비행기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정신없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가 자리에 책상을 두는 경우가 많다. 직위가 더 높아져 독립 사무실을 갖게 되면 창문의 존재는 더 묘해진다. 직위가 높을수록 창문이 더 많거나 창문이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4개 면 중 2개가 유리창인 ‘모퉁이 사무실’은 직장 내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다.
■고릴라 대장도 높은 바위 차지
저자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몸이 오랜 진화 과정에서 햇빛 효과를 체득했기 때문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하고 온화한 빛은 감정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생활리듬, 호르몬 분비와 체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류가 사바나를 발견한 후 갖게 된 초록색에 대한 본능적 애정도 창가 자리를 선호하게 한다. 실제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환경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의 긴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님 사무실’은 창문도 크고 많을 뿐더러 높은 곳에 위치한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곳이다. 저자는 조직심리학자인 외르크 펠페의 말을 빌어 “남들보다 더 눈에 띄고 더 크게 보이고, 우월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두머리 고릴라가 하루 종일 바위 위에 앉아 다른 수컷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오버랩 된다.
관련기사
■남성 화장실서 벌어지는 공간 선점 경쟁
옆 공간이 비어 있기를 바라는 심리 역시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겨났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 두기’ 본능 때문이다. 저자는 45~50㎝를 밀접 영역, 50㎝~1.2m를 사적 영역, 1.2~3m를 사회적 영역, 그 이상은 공적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영역 이하로 거리가 좁혀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특히 밀접 영역 정도의 거리가 되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고, 사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밀접 영역과 관련된 인간의 심리적 불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 남성 공중 화장실이다. 소변기가 3개 있을 경우 대부분의 남성들은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으로 간다. 첫 번째 남성이 맨 오른쪽을 차지하면 두 번째 남성은 맨 왼쪽으로 간다. 세 번째 남성은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가운데 소변기를 쓰지 않으려 한다.
■자기 보호하려 벽면 자리 선호
자기 보호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또 다른 공간은 벽과 맞닿은 자리다. 실제로 음식점 좌석은 벽 쪽에서부터 차기 시작한다. 파리와 달리 시야를 360도 확보할 수 없는 인간에게 뒤에 뚫린 공간이 아니라 벽이 존재하면 적어도 시야의 절반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 심리적 피곤함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책은 공간 및 공간 이동과 관련된 인간 심리 50가지를 다룬다. 개개인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우리 생활과 공간에 적용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를 바라보는 건물의 벽면에 창문을 많이 설치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창문이 부족하더라도 녹색 식물을 일하는 공간에 많이 배치하면 근무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등 뒤에는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1만5,000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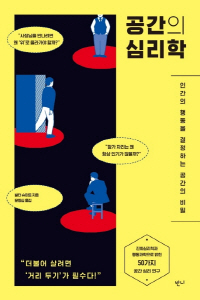

 yhchung@sedaily.com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