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랄, 하고 가만히 불러보면 가슴이 뛴다. 뭘 지를까, 생각만으로 이미 설렌다. 세상엔 수많은 지랄이 있고 그중 최고는 단연 돈지랄이다. 이 단어는 오랫동안 나쁜 의미로 쓰였다. 착한 소비, 현명한 소비의 반대말로 통했다. 온 세상이 내가 내 돈 쓰는 것에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무지하게 애쓴다. 헛돈 쓰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니 한 몸 편하자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마라. 그거 다 돈지랄이다. (…) 돈을 쓴다는 건 마음을 쓴다는 거다. 그건 남에게나 나에게나 마찬가지다. ‘나를 위한 선물’이란 상투적 표현은 싫지만, 돈지랄은 ‘가난한 내 기분을 돌보는 일’이 될 때가 있다. 내 몸뚱이의 쾌적함과 내 마음의 충족감.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나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영영 모를 수도 있다. (신예희,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2020년 드렁큰에디터 펴냄)
‘돈지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아무 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돈지랄은 ‘네 분수와 주제를 파악하고 돈을 쓰라’는 힐난이 담긴 말이다. 하지만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왜 남들이 내 분수와 재정상태까지 운운하는 걸까.
신예희 작가는 20년간 프리랜서 작가로 살며 돈지랄의 고수가 됐다. 흔히 돈지랄이라고 하면 무분별한 쇼핑과 후회의 카드명세서를 떠올리겠지만 신 작가의 돈지랄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정확하게 겨누는 저격수처럼 주도면밀하다. 신 작가는 쓸 때 확실히 돈을 더 쓰고 시간과 체력은 철저히 아낀다. 그렇게 아껴둔 몸과 마음과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동원한다.
세상은 돈을 내줄 때도 우리의 지위와 주제를 냉혹하게 계산하더니, 돈을 쓸 때도 네 분수를 알라 훈계한다. 이런 오지랖과 죄책감은 시원하게 걷어차고 가끔은 나만을 위한 돈지랄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 행복과 보상을 당당히 누리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것이다. /문학동네 편집팀장 이연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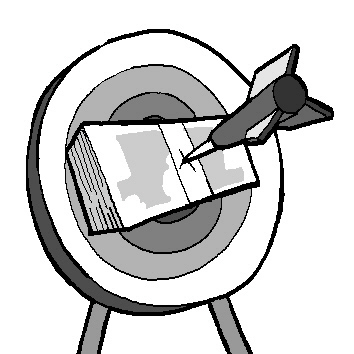


 yhchung@sedaily.com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