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거대한 무리의 조합이다. 떠돌아다니던 선조들은 무리를 지어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이 집단·사회·국가로 발전했다. 신간 ‘인간 무리’는 이 같은 무리 짓기의 본성을 인간 종(種)에서 더 나아가 개미, 침팬지, 코끼리 등 다른 동물군으로까지 확장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동물들의 사회생활 양식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자연사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100여 개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개미의 사회적 행동, 숲 생태계, 인간과 동물 사회의 진화 등을 연구해 온 마크 모펫 저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내부자와 외부자를 알아보는 방법, 즉 ‘표지’에 주목했다. ‘우리 사회’라는 범주 밖 존재에게 ‘외부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경계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표지의 사소한 차이가 개체와 개체 사이에 골을 만들고, 이것이 세력 다툼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 세력다툼이 정치, 사회, 외교적 문제로 발현되곤 한다. 표지를 통한 사회 구성 방식은 동물마다 천차만별이다. 개미에겐 냄새, 고래에겐 소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고 사회와의 제휴 관계를 입증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포유동물 사회에서는 한 개체가 상대에 대한 개인적 호오(好惡)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알아야만 사회가 성립되고 기능한다. 기억 용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포유동물 사회의 규모는 기껏해야 수십 개체 정도로 제한된다.
그런데 같은 포유류인 인간은 어떻게 이런 한계를 뚫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뒤섞인 ‘익명 사회’로서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경우 단순 냄새와 소리를 넘어 억양, 몸짓, 옷 스타일, 의식, 깃발에 이르기까지 표지의 영역이 넓다. 여기에 잠재의식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는 표지까지 더해져 인간은 낯선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표지만으로 거대한 세계가 형성, 유지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다양성이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정체성이 분화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표지는 확장되고 익명사회가 지탱되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성은 사회적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능과 관점에 의해 추진되는 창조적 교환, 혁신, 문제 해결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건설하고 또 붕괴시키는 배제와 포용, 분열과 화합의 과정을 생물학, 역사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분석을 흥미롭게 서술한 책이다. 2만 9,8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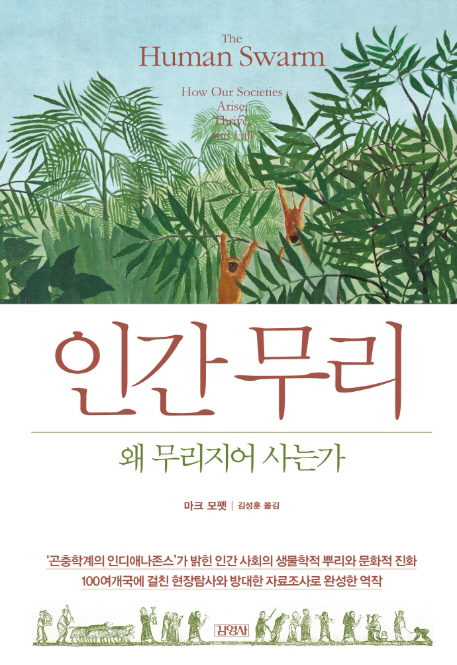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