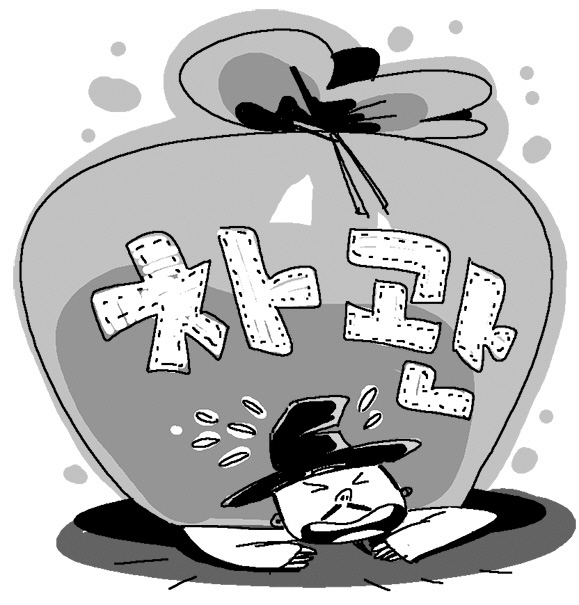1882년 8월26일 조선이 청나라에서 돈을 빌렸다. 서구 문물과 무기 제조기술을 익히려 청에 파견했던 영선사의 경비를 위해 2만8,250냥을 빌린 적은 있어도 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한 해외 차관은 처음. 금액도 컸다. 50만냥. 조선은 6개월 후 20만냥의 차관을 더 얻었다. 목적은 재정난 타개와 근대화. 서구 문물 도입과 외국인 고문 초청에 경화(硬貨)가 필요했으나 재원이 없었다. 국가 재정은 관원과 병졸들의 한 달 치 급여를 주는 데도 모자랐다.
청은 상국(上國) 입장에서 순순히 조선을 도우려 차관을 내줬을까. 정반대다. 차관을 매개로 형식적인 조공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속국, 반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다. 돈이 절실했던 조선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차관에 앞서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마음껏 장사하고, 심지어 ‘물고기들이 기선에 놀라 대피할 때 청 어선들이 조선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준 것도 큰돈을 빌리기 위해서다.
조선 관리들이 ‘안보 우산까지 제공하는 상국’으로 여긴 청은 철저하게 주판알을 굴렸다. 차관 교섭과정에서 조선의 경제력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한 뒤에는 더욱 고압적으로 나왔다. 결국 해관(세관)의 관세권과 홍삼 가공 및 무역권까지 넘어갔다. 근대화를 위한 내자 동원의 유력 수단이 애초부터 외세에 넘어간 것이다.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려던 청과 친청 수구파는 다른 장난도 쳤다.
김옥균 등 개화파가 1883년 말 일본 차관 도입을 추진하자 온갖 방해공작을 펼쳤다. 대일차관을 희망한 고종의 친서가 위조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적도 있다. 수구파의 무고를 일본이 믿는 바람에 맨손으로 돌아온 개화파는 2년간 추진한 근대화 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자기주장이 강한 개화파보다 이권을 우선시하는 수구파가 오히려 다루기 좋다는 판단 아래 시기를 기다렸다. 일본의 예상대로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수구파는 대일차관에 앞장섰다.
차관을 또 다른 치부 수단으로만 여긴 정치권에 의해 조선의 이권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자본에 속속 넘어갔다.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국채보상운동도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조선은 국권을 잃었다.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분단을 강요받은 한국사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환능력 밖의 외채는 위험하다. 외환위기(IMF 사태)도 일본계 단기자금이 갑작스레 연장을 거부하며 불거졌다. 외세에 의존해 사익 챙기기에 골몰하던 행태가 이젠 과연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