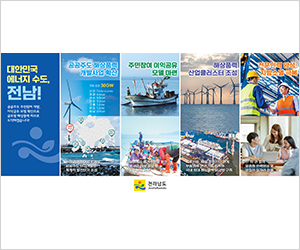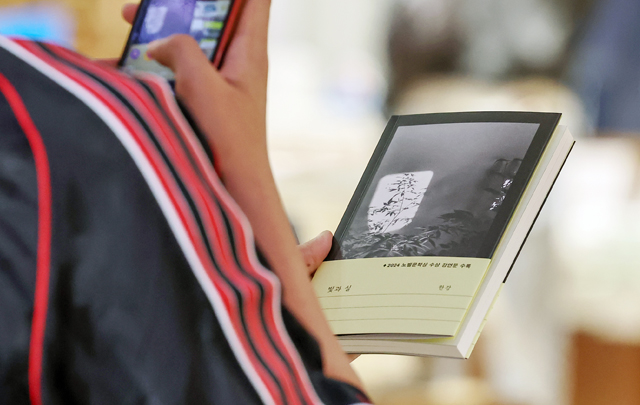이동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핵심은 기자와 검사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나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간의 갈등이다. 정치권력 쪽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권력의 정점인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각각 대리전을 벌이는 구도이다.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둘의 공모를 기정사실로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빼앗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가 상급자인 현직 검사장을 현행범으로 간주한 것도 놀랍고 공모 증거를 잡으려는 집념도 무섭다.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 부장검사는 무모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음에도 승진했다. 정치권력의 검찰권력 무력화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 이 인사에 야당은 “몸을 날리는 공무원이 많이 나오겠다”고 논평했다.
이 사건의 공모혐의는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는 지극히 비법률적인 용어로 규정해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최순실이 미르재단 등의 모금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철저히 배척됐고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일부만 가담해도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공모’의 증거로 제시한 이 기자와 한 검사장 간 녹취록 대화를 보면 공모 증거라기보다는 검사를 상대로 한 기자의 통상적인 정보탐색 시도에 검사가 수사경험을 말해주는 수준이다.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검찰개혁은 검찰에 의한 정치비리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무력화 의지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 레임덕 시기의 검찰 수사,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뿌리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검찰의 수사가 노 대통령의 자살을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검찰을 그냥 뒀다가는 자신들도 같은 운명이 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강박은 커지게 마련이다.
검찰권력 무력화가 윤 총장 무력화와 동의어가 된 것도 거기에서 연유한다.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이 시작한 조국 수사나 울산 선거부정 혐의 수사가 권력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박관념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됐을 법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고 국민에 대한 검찰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들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비리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 사리가 이처럼 명백함에도 현 집권세력은 검찰이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해 정치비리 사건을 기획해왔다고 본다.
정치권력의 검찰 무력화 시도로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는 검언 공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고 있다. 권력형 비리는 불리한 수사 중단과 무리한 수사 지속으로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4년 전 검찰 수사에 박수 쳤던 권력이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개혁을 명분으로 부러뜨리려는 현실이나 공모 사건의 부메랑 현상을 보는 것은 아이러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