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둘러싼 혼돈 속에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폭력사태를 우려해 일부 지역은 방위군까지 배치할 만큼 미국 내 갈라진 민심은 점차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유권자의 충돌에 이어 후보자 캠프의 개표 중단 소송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너무 과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니 민주주의를 줄여야 한다”고.
신간 ‘10% 적은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평등 원칙’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제안은 대략 이렇다. 투표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분별할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두고, 국회의원 임기를 더 늘린다. 이런 제안이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자는 100% 평등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민주주의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10% 축소할 때 국가 이익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인 1표가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엔 ‘유권자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저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해의 3분기 동안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시안적인 유권자 모두에게 100%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식을 갖춘 유권자의 선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상원의원의 10%는 엘리트 대학 졸업생들이 선출하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어 미국도 상원의원 10%의 투표권을 상위 140개 대학 졸업생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민주주의를 줄여나가는 또 다른 방법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이다 . 저자는 유권자의 건망증에 빈번한 선거까지 더해져 선거 직전에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정치인이 선출되고, 유권자는 다시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임기를 현행 2년은 4년, 4년은 6년으로 각각 늘려 정책 추진에 있어 근시안적 사고와 포퓰리즘을 줄여나가자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책이다. 민주주의가 경제성, 비용대비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에 일부 공감 가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안들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1만 9,8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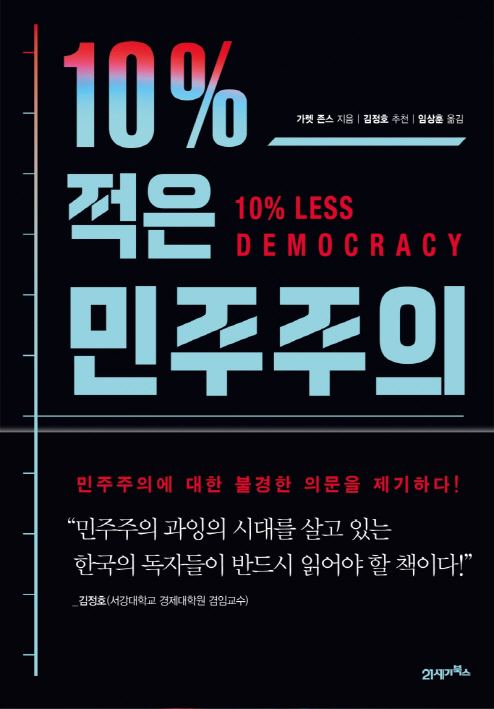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