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는 일상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화로 인한 놀라운 변화 속도에 인간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많다. 디지털 거대 기업들의 독점, 부의 양극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종속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냥꾼, 목동, 비평가’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상과 미래 방향성을 ‘독일 현대 철학의 아이콘’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가 분석하고 비평한 책이다. 그는 특히 디지털 거대 기업의 무제한 팽창과 이에 따른 독점을 우려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거대 기업들이 기존의 위계 질서를 광범위하게 무너뜨리는 동시에 불평등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독일 정치권을 비판하지만, 한국 역시 디지털화에 대한 방향성과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적을 들을 법하다.
저자는 생업으로서의 노동과 자유로운 활동으로서의 노동을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인간의 얼굴을 한 디지털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유토피아에 대한 구상을 디지털 시대로 옮겨놓은 셈이다. 이들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유토피아에서의 삶을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소 떼를 돌보며 저녁 후에는 비평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것도 내가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이므로 사냥꾼, 어부, 목동, 비평가 등등이 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한 바 있다. 책의 제목은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왔다.
책은 이어 디지털화가 디스토피아로 흐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가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이다. 저자는 디지털 경제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품 가격이 저렴해져서 어차피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은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게 생업노동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호기심과 내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자기계발에 써야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기술적으로 조율할 수 없는 디지털화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단으로 ‘정치’를 불러내야 한다고도 말한다.
독일 ‘레벤자르트’지는 이 책이 “우리의 방향 설정과 토론에 기여할 중요한 가이드 북”이라고 평가했다. 저자 역시 책의 말미에서 지금의 사회적 환경은 비관주의가 퍼지기 좋은 모습임을 인정하지만 낙관주의적 태도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방향 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만원.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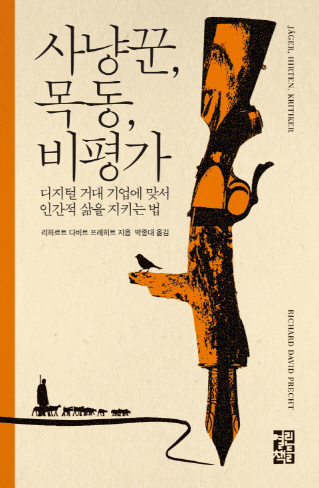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