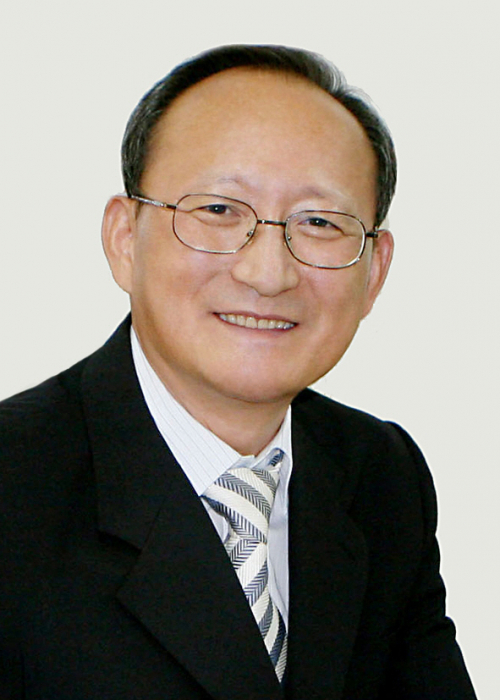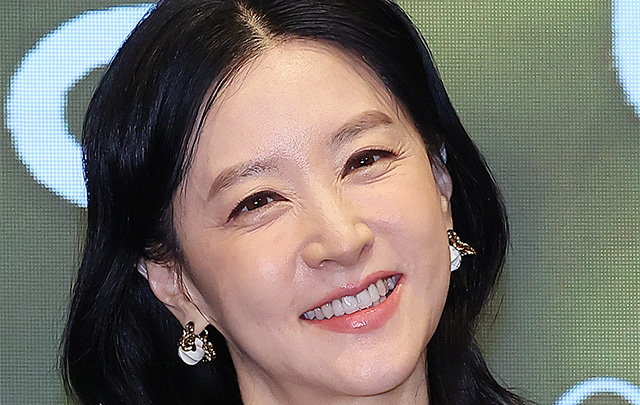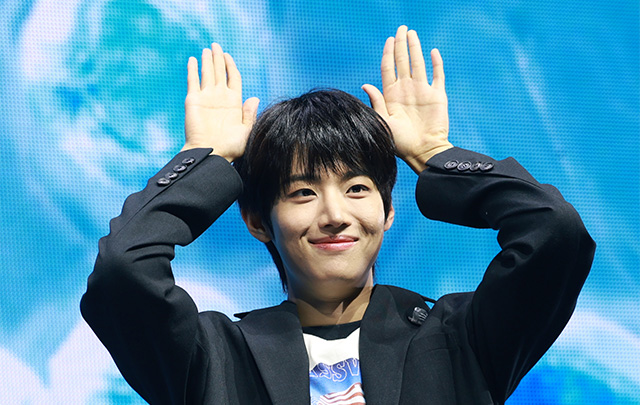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20세기의 주류 거시경제학이 과연 21세기에도 옳은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와 같은 질문의 핵심에는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의 기제가 과거와 다르게 변한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단기에 인플레이션은 크게 보아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일어난다. 때로 수요나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심리 또는 기대(예상)이다.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재화를 매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에 인플레이션이 실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기대를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은 고전적인 화폐수량설이다. 그리고 화폐수량설에서 주목하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화폐 공급 곧 통화량이다. 물론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통화량이고 그 증가율이다. 이 같은 관심이 당연한 것은 물가 수준은 재화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고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한 단위의 재화와 교환되는 화폐의 양 곧 물가 수준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수시로 변하는 단기에 물가와 통화량의 일대일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 기간에 걸쳐서는 반드시 성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폐 공급과 인플레이션의 그 같은 긴밀한 관계가 깨진 듯한 현상이 새 밀레니엄 들어 나타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통화량을 대거 풀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정책 이자율을 0%로 내려 유지하고 있다. 통화를 얼마든지 풀 용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화의 증가 혹은 통화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0%에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을 찍어 재정에 사용하자는, 무모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모를 주장까지 등장했다.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문제냐는 강변이다. 이 나라에서도 얼마 전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돈을 찍어 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작용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잠자고 있을 뿐 화폐수량설이 함의하는 인플레이션의 기제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의 종식을 기대한 시장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이자율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가 크게 반영되는 장기이자율 또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경제학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몇 개 가운데 하나가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에 따라 일어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화가 다량 풀려 있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깨어나면 인플레이션은 불현듯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이다.
/여론독자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