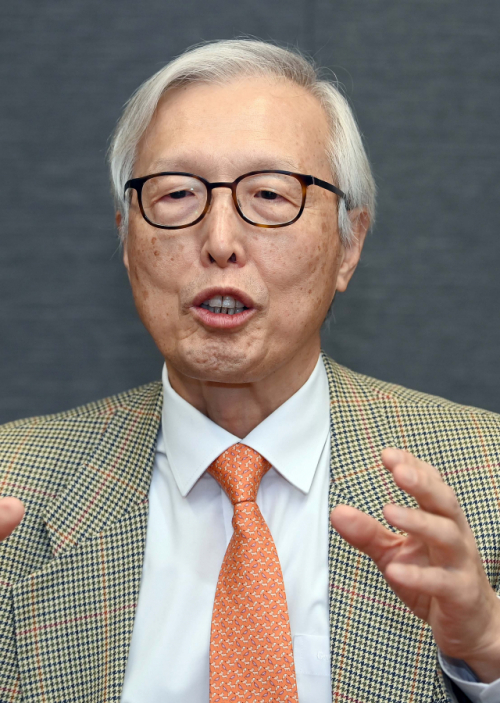“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에는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가미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대사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객관적이지 않고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인 만큼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과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신 전 대사는 “위안부 피해자 36명이 이미 배상금으로 1억 원씩을 수령했다. 피해자의 75%가량은 배상금 수령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결국 거부한 사람만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막연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실에서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정부와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컨센선스를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액션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을 설득해서 정부가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중에서도 간극이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한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문제는) 지금은 정의연에 속했던 할머니들은 본인의 의사인지, 단체 의사인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하고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 시기적으로 방향 전환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방향 전환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엄청난 외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안(案)을 일본이 거부할 경우 미국 도움(개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대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공동체에 북한 참여 제안에 대해 혹평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멀어지는 고립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하려 하는데 한국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