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가 뜨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의 타임라인이나 구글 검색 결과의 중간중간에도 광고가 숨어 있다. 신기하게도 내가 관심 있는 상품들의 광고만 콕 집어서 나오는 것은 검색 기록,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클릭 이력 등이 맞춤형 추천으로 이어지는 알고리즘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빼낸 개인의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상업적 재료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상당하다.
사회학자인 쇼샤나 주보프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서 ‘감시 자본주의시대’에서 이처럼 인간의 경험을 공짜로 추출해 은밀히 상업적 행위의 원재료로 이용하면서 권력을 얻는 새 자본주의 체제를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아울러 이러한 체제에서 개인 시간을 최대한 뺏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의 활동과 정보를 긁어모아 기업에 팔며 막대한 광고수입을 챙기는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을 ‘감시 자본’이라고 지칭한다.
저자는 감시 자본주의가 “본질상 기생적이고, 노동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 빨아먹고 산다”고 지적한다. 감시 자본주의는 나아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통제하며 조종한다. 개인은 이들이 제공하는 광고와 정보에 부지불식간에 길들여진 맞춤형 고객이 되어 기업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이처럼 감시로 얻은 기업의 힘은 권력이 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타인과 직접 마주치며 실제 삶과 접촉하는 대신 소셜 미디어 속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데 그치게 되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을 인간관계의 척도로 여기며 여기에 목을 맨다. 저자는 “이런 사회에선 집단 압력과 컴퓨터가 계산한 확실성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개별 존재가 느끼는 현실과 그들의 사회적 기능은 소멸된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감시 자본주의 체제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나 다름없다. 문명의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질문인 ‘누가 아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앞에서 우리 개인과 사회는 무슨 답을 하겠냐고 저자는 되묻는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서비스의 사용자인 세상에서 감시 자본의 수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노하며 저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늘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의 안부를 확인하더라도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한다. 3만2,000원.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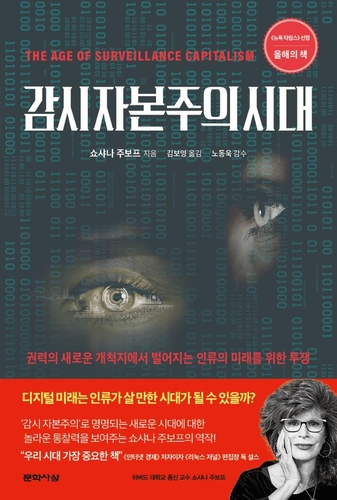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