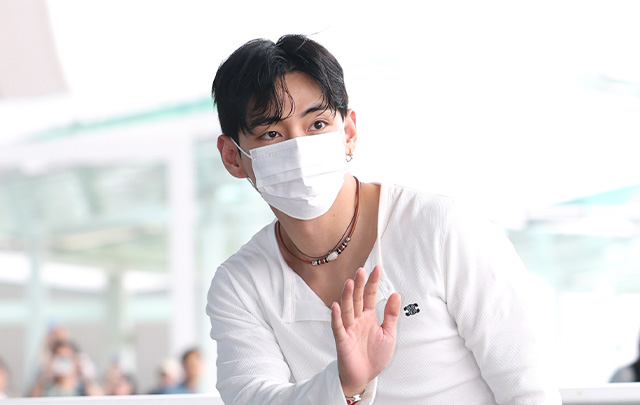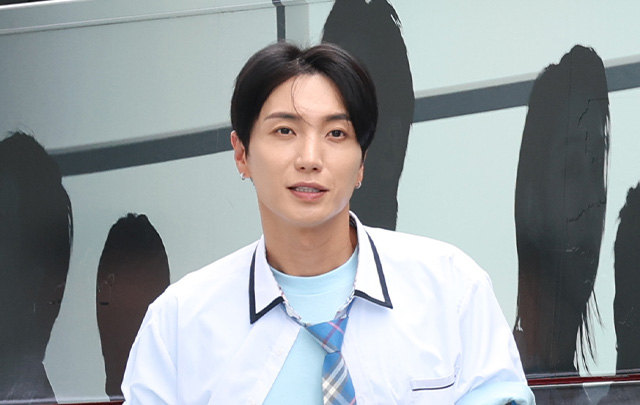2015년 12월 삭풍이 불던 겨울날. 1,145명의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원주 신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강원도의 랜드마크로 아름답기로 소문나 드라마 촬영 제안이 오는 사옥이건만 직원들은 늦게 완공되기를 소망했다. 하루라도 더 서울에 머물기를 바랐던 탓이었다.
곧 2사옥 건립에 착수했다. 2019년 12월 2차 이전을 하던 날도 원주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날이 궂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터전 옮기기를 겁내는 인간의 본성이 투사된 것이리라.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직원만 5만 2,000명이다. 심사평가원 원주 사옥에는 3,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대거 이탈을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여전히 원주에서 일한다.
3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생겼다. 원주살이를 걱정하던 어른들과 달리 넓고 현대적인 어린이집은 직원 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덕분에 원주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도시가 됐다. 혁신도시에는 ‘별다방’도 두 개나 생겼다.
공공기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출발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을 했다 싶지만, 원장이 된 이후 지역 상생 협력이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새로 커진 때문은 아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살 수 있어야 조직의 생산성이 커지는 것을 절감한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
내가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은 강원도에 녹아들고 있다. 본업과 연관성이 높은 보건 의료 재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2019년 고성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약을 집에 놓고 황급히 피난 나온 환자들이 많았다. 이들의 정보를 재빠르게 제공해 약을 재처방받도록 했다. 강원도 주민이기 때문에 더욱 발을 동동거렸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합심해 혁신도시 전체 주문량의 71%를 구매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상인회와 혁신도시 안내 책자 발간 등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의 보건 의료 산업과 상생 협력도 늘 모색한다. 공공 기관장들과 자주 모여 원주와의 화학적 결합을 고민한다.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과제들도 만난다. 우선은 교육 환경이다. 보육부터 평생 교육까지 멀리 나가지 않고서도 욕구가 충족되면 좋겠다. 직원과 가족 가운데는 아픈 이들도 많다. 다행히 원주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어 웬만한 질병은 KTX를 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흔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젊은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목 문화다. 혁신도시에도 시설 좋은 극장이 있지만, 직원들은 ‘기생충’과 ‘미나리’를 보기 위해 주말이면 서울로 향한다. 브랜드 상점을 ‘복붙’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화 욕구를 채우려면 한참 더 노력을 쏟아야 할 것 같다.
공공 기관의 지역 협력이 직원의 행복을 위하듯, 지자체가 이전 공공 기관에 하는 투자는 결국 지역의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직원들이 ‘혁리단길’쯤의 이름이 붙은 거리를 유모차 끌고 거닐며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