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육아다.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 그만큼 육아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직장인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육아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재무 상황도 탄탄하다. 서울경제신문은 진학사 취업정보사이트 캐치(CATCH)의 도움으로 재무평가(약 8만개 법인 기준)와 재직자 평판(조직문화, 복지, 성장성 등)이 높고 육아휴직 제도가 우수한 기업 4곳을 소개한다.
KT&G는 임신한 여직원에게 최대 1년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가 특징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다. KT&G는 육아휴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정부보조금과 합치면 200만 원이 된다. 육아휴직 2년 차에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해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직자 평가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4개 기업 가운데 1위다. 재무평가도 90.7점으로 유일하게 90점을 넘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설문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사 1년차 한 직원은 “연봉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는 등 복지가 너무 좋다”며 “서로 잘 어울리는 분위기가 강해 평판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육아휴직을 최장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는 90일이다. 여기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최대 9개월), 희망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특히 신세계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도입했다.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같이 지낼 수도 있다. 입학년도 내 1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돌봄휴직제도’ 덕분이다. 재직자 평가는 82.5점, 재무평가는 87점을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설문에는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사 8년차 한 직원은 “연차, 근무시간, 사내 분위기는 다른 회사에 비해 낫다고 느낀다”며 “다만 승진하려면,기업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롯데쇼핑은 여직원이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이 덕분에 모든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휴직 첫 달에는 월급의 100%를 보전하는 복지도 특징이다. 캐치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처럼 의무적으로 휴직을 써야 하고 임금 100%를 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직자 평가는 77점으로 다른 3곳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무평가도 79.3점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는 질문에는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사 2년차 한 직원은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이라면서도 "10년에 1번은 지방에 있는 점포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임신기간 단축근무, 입학자녀 돌봄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10월부터 남녀 구성원 모두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보다 혜택을 넓혔다. 재직자 평가도 83.2점으로 KT&G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재무평가와 재직자 평가 또한 각각 87.3점, 83.2점으로 4개 기업 가운데 상위권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는 설문에서도 66%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입사 4년차 한 직원은 “아무런 눈치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입사 3년차 다른 직원은 “최근 야근이 사라졌다”며 “성과별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난다’는 직원이 많다”고 전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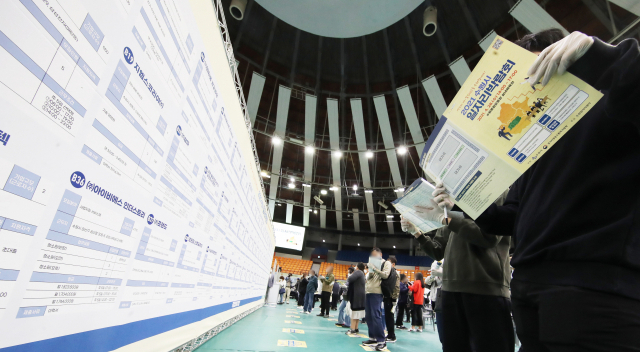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