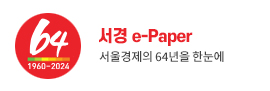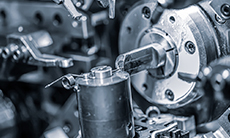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즉시 인상을 주장한 ‘소수 의견’이 등장하며 긴축이 임박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3·4분기 성장률은 전기와 비교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이 선방하더라도 0%대에 그칠 수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거품도 꺼지지 않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이르면 8월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다.
긴축의 깜빡이가 켜졌음에도 우리 경제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주체의 부채가 5,000조 원에 달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가계 신용 잔액은 매달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채의 72%는 금리 변화에 취약한 변동 금리로 돼 있다. 기업 대출은 더 살얼음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기한이 9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없이 상환을 또 연장할 경우 부실은 제2·3금융권으로 빠르게 전이될 것이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금리 인상이 눈앞인데도 정치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해 2조 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없던 일로 할 기세다.
경제 시스템이 유리그릇처럼 허약한데도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장에서는 국내 투자를 막는 규제들이 가득하고 퇴행적 노사 관계도 계속되고 있다. 여권이 반도체 등의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와 핵심 산업에 대한 탄력근무제 등 기업의 요구는 모조리 빠진 채 맹탕이 될 조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축과 경기 부양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런데도 구조 개혁 없이 재정만 쏟아붓는다면 악성적인 ‘더블딥(경기 일시 상승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