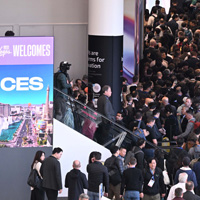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이 7일 기준 703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7%(33조 2,877억 원) 늘어났다. 정부의 증가율 목표치 하단(5%)에 근접한 것이다.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해도 올해 대출 여력은 13조 5,500억 원에 불과하다. 3분기에 대출이 13조 7,805억 원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이내로 만드는 게 그리 쉽지 않아 갈수록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가계 부채 대책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진행돼왔다. 일방통행 정책에도 가계 부채 해결이라는 명분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투박한 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은 증폭됐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낮은 금융회사를 찾아 헤맸다. 풍선 효과에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도 극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이 곧 발표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구제 방안을 얘기했지만 금융회사들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목표치에 맞출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런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가계 부채 대책이 단기 목표에 급급하다 보니 연말에 확 줄었다가 연초에 다시 늘어나는 ‘대출 요요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결국 가계 부채의 악령에서 벗어나려면 대출 억제 조치와 함께 부채 폭탄의 원인들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거시적인 분석과 수술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출은 물론 2030세대의 빚 폭탄, 과도한 증시 레버리지 등 미시·거시 전반의 건전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부채를 패키지로 바라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하다. 이런 시스템 없이 땜질로 5,000조 원이 넘는 부채의 암 덩어리를 치유하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겠다는 망상과 다를 바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