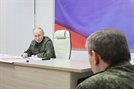반도체 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 제품인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10월 평균 3.71달러로 전달보다 9.51% 급락했다. 2019년 7월(-11.18%) 이후 최대 낙폭으로 시장의 예상(-5%)보다 2배 가까이 더 떨어졌다. 1년 만의 하락세 전환은 ‘피크아웃(고점 찍고 하강)’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전 등 대형 고객사들은 경기 둔화에 대비해 수요를 줄이고 있고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미 감산을 시작했다.
혹한은 이제 막 시작됐고 추위는 꽤 길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낙폭이 고점 대비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기업들이 재고량을 줄이고 14나노 D램 등 첨단 제품 양산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시장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기업 혼자서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 기업들이 ‘나 홀로 사투’를 벌이는 것과 달리 해외 경쟁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특집 기사에서 삼성전자를 향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거침없는 면모를 보여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의 공격 투자는 물론 기존 하드웨어 사업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신산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더 절실한 것은 정부의 근본적 자세 전환이다. 정부는 ‘반도체는 기업 홀로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특혜로 치부한 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읍소를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느 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영원한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이 패러다임 전환에 휩쓸려 쇠락하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