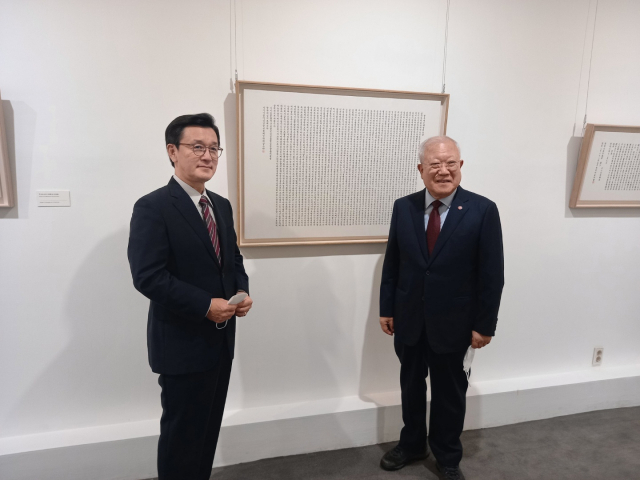“글씨는 단순히 기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쓰는 이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재민체(在民體)’는 몰락하는 구한말 시기에 글씨에 담긴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과 희망·기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새 한글 글꼴 ‘재민체’에 이어 최근 한자 글씨체까지 선보인 박재갑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민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날카롭고 강건한 글씨체는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상을 담은 것”이라며 개발 이유를 밝혔다.
박 명예교수와 김 교수는 지난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내린 ‘대한의원개원칙서’를 바탕으로 한글 재민체를 만들고 이를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1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한자 글꼴을 완성했고 이를 기념해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함께 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에 선보인 한글 2,350자와 한자 4,888자를 활용해 만든 9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여기에는 글꼴 개발의 계기가 된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지석영 선생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 3·1독립선언문 원문 등도 포함돼 있다.
박 명예교수와 김 교수의 새로운 글씨체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은 글씨를 보기 힘들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박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서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것을 비슷하게 쓴 것이 대부분”이라며 “재민체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단아한 글씨체에 매료돼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재민체처럼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씨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정체성을 가진 글씨를 본다는 점에서 쓰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씨란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글씨는 글 쓰는 이의 감정과 생각·마음을 오롯이 담은 그릇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재민체를 통해 몰락하는 구한말 시기 국가와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희망과 기개를 담고 싶었다”며 “글씨체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내용을 담는다면 개발자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가 한글에 만족하지 않고 한문 글꼴까지 만든 것은 우리말이 갖는 독특함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우리말에는 동음이어(同音異語)도 있고 지명과 인명 같은 고유명사도 있어 한글 표기만으로 모든 것을 표기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궁서체 등에는 한자가 아예 없다. 글꼴이 다른 글씨체를 쓸 경우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한자 개발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글만 있으면 됐지 한자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한글을 사랑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소국이 아니다. 반도체도 앞서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대국의 대열에 올라섰다”며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는 한자다. 이제는 한자를 한글 안에 포용해서 거느리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와 김 교수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한자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한자를 표현할 수 없다. 한자로 된 대한민국 모든 행정 지역명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약 3,000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들이 준비하는 ‘재민체 3.0’은 이를 위한 도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