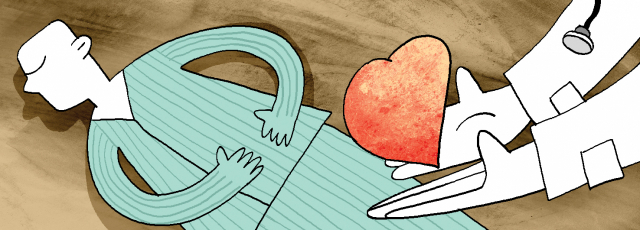몇 년 전 병원에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고, 힘든 만큼 빨리 낫는 것 같지도 않아 낙담하고 있었다. 영원히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평생 병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걱정으로 초주검이 된 어느 날, 치료과정이 너무 아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피하지만 아픔이 더 컸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다 큰 어른이 어린애처럼 펑펑 우니까, 놀란 의사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많이 힘드시죠. 차도가 더뎌 보이지만 분명 낫고 있어요. 사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거의 끝났고, 환자분이 스스로 힘을 내셔야 해요.” 약도 주사도 충분히 투여했으니, 이제 내 몸의 자기치유력이 등판할 시간이었다. 의사가 ‘나의 일은 거의 끝났다’고 말한 순간, 환자는 자칫하면 낙심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의학의 힘을 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사는 나에게 고유한 면역력과 자기치유의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나에게 내 몸을 괜찮게 할 힘이 남아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은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자기존재의 확인이었다.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치유할 힘이 있니? 의사도 약사도 아니지만, 넌 너 자신을 치유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나는 무력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강인한 치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줄이고, 있는 힘껏 내 안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어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을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라는 의사의 지시는 바로 자기 안의 치유력을 끌어내라는 해석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의사의 지시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자라는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태도로 말해주면 환자는 없던 힘도 바짝 내어 자기를 돌보는 최고의 치유사로 거듭나게 된다.
내가 의사에게 받은 최고의 치유는 각종 주사나 물리치료가 아니라 ‘내 안의 치유력이 있음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의사의 실력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치료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 그날의 기억이야말로 최고의 치유였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나의 심리치유 에세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나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해주신 한 독자는 내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종교도 없이 버티세요. 사주팔자도 안 보고 타로점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시지요?” 그러고 보니 나는 어느 순간 운명을 타인에게 물어보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심리학 공부와 글쓰기가 필요했지만, 그 과정은 힘들기보다는 즐거운 자기발견이었고, 아프고 괴롭기보다는 아름답고 눈부신 자기치유의 과정이었다. 사주나 토정비결을 보는 것보다 ‘그냥 나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나았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타인의 예언을 들을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실천의 순간이 더 기쁘고 보람찼다. 물론 나도 너무 힘들고 아픈 순간에는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아직 아픔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 때, 혹은 아픔이 회복세에 있을 때쯤, 내 안의 자기치유력을 꺼내어 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나쁜 의사는 환자의 치료 의지를 꺾고 병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좋은 의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의술을 보여준다. 위대한 의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준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