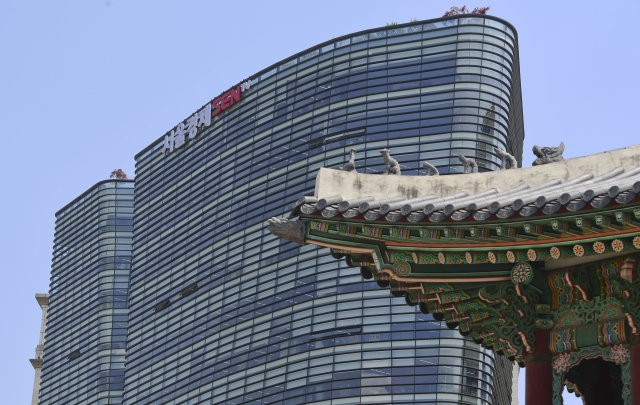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법을 개정해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의 집단행동에 따른 손해를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쟁의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주도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학자들이 천착해 온 오래되고도 현재 진행 중인 테제 중의 하나다. 이 문제의 본질은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상충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소 등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조합원이 생계 곤란을 겪는 등 노동기본권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폭력·파괴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다. 그럼에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혹자는 불법 파업 문제의 원인을 단체교섭·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요건이 외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일례로 정리 해고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하면 불법 파업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리 해고에 앞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정리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와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정리 해고 백지화 등과 같은 소위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경영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독일·일본 등에서도 경영권은 대체로 존중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쟁의행위가 극단적·과격한 양상을 띠게 되는 배경에는 경영권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인식 차도 한몫하고 있다.
노사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 관계에서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배소·가압류는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파업은 자제해야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파업 손실에 대한 손배소·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기본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압류 금액의 상한을 두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