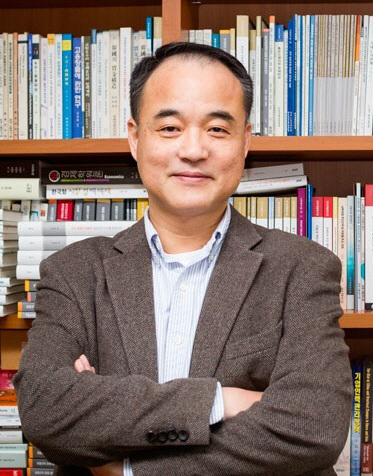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명으로까지 하락해 매년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사실 저출산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에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왔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저출산 대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해봐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보육 및 교육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는 게 쉽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통계만 봐도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높을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여성 배우자 연령이 40~45세인 부부들 가운데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에 속한 부부의 자녀 수는 각각 1.85명, 1.69명으로 그 차이가 0.16명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20%의 월 소득은 각각 1031만 원, 247만 원으로 그 격차가 784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소득 격차에도 자녀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저출산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2013년 자녀 1명의 양육 비용이 3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을 만큼 저출산이 돈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저출산 대책은 시종일관 지원금을 쏟아붓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효과도 없을 지원금 정책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높여왔으니 천문학적 예산에도 출산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나 다름없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가 이미 50년 전에 지적했듯이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바로 자녀 보육과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이다. 과거에는 일과 가정이 상충할 경우 여성들이 부득이하게 일 대신 가정을 선택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비혼과 만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일과 가정의 저울질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을 그만두지 않고는 자녀 돌봄이 불가능한 여건은 그대로 방치한 채 육아휴직만 늘린다고 결혼율이 오르고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굳이 일을 쉬지 않아도 자녀가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부모, 특히 어머니를 자녀 보육과 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어머니는 보통 영유아 돌봄에 묶인다지만 최근에는 취학 자녀에게 묶이는 양상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그러하고 중고생 자녀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결국 지금은 보육뿐 아니라 교육 단계에서 어머니를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방과후 돌봄이 반드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맹목적인 대입 준비 기관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회화를 거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보육 시설이든 학교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한 저출산 추세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부부 각자에게 월 300만 원씩 지원하는 제4차 기본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밑 빠진 독이지만 계속 물을 더 퍼붓겠다는 막무가내 정책이다. 셋째 자녀를 서울대에 무조건 입학시키자는 황당한 주장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