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소아 등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 정책 수가 도입, 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으로서 뇌경색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뇌경색은 뇌출혈에 비해 경미해 보일지 모르나 전체 뇌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뇌출혈의 1개월 사망률이 25%로, 뇌경색(6%)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추적 기간을 늘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뇌출혈의 1년 사망률이 30%로 소폭 증가하는 데 비해 뇌경색은 15%로 2.5배 증가한다.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뇌졸중의 중중도를 평가하는 뇌졸중 척도(42점 만점)를 예로 들어보자. 증상이 없는 경우를 0점, 4점 이하를 경증으로 분류한다.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3개월 후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10%씩 감소한다. 0점인 환자가 3개월 뒤 정상 복귀할 가능성은 90%지만 비교적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5점 환자가 정상 복귀할 가능성은 42%까지 떨어진다. 과연 이들을 경증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 발병 후 남은 생을 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가족과 사회는 이러한 장애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뇌경색 환자 한 명의 5년 치 의료비는 평균 1억 5000만 원, 후유 장애가 남은 환자의 비용은 3억 4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도 시술, 수술에 무게를 둔 점이다. 24시간 고난도 수술과 시술이 가능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은 매우 복잡한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일부일 뿐이다. 고난도 수술과 시술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는 뇌경색의 15%, 뇌출혈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는 뇌경색 환자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약물 치료 등 내과적 치료가 주로 행해지는 뇌경색에 대한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 대학 병원뿐 아니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조차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뇌졸중 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은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질환을 얼마나 진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중증도 A 등급 질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뇌경색 진료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몇 년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일 뿐이다. 매년 8만 명이 넘는 뇌경색 환자가 발생한다. 이들 중 사망자는 만 명이 넘고, 훨씬 많은 수가 장애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 정부가 뇌경색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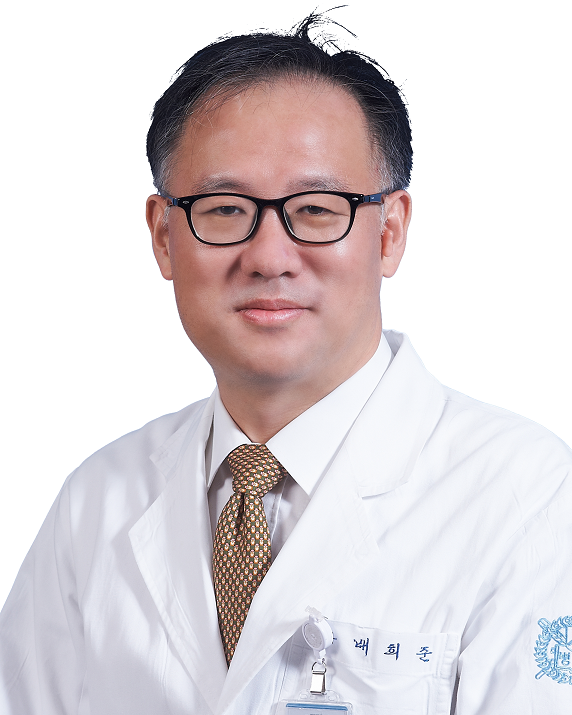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