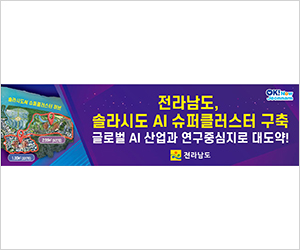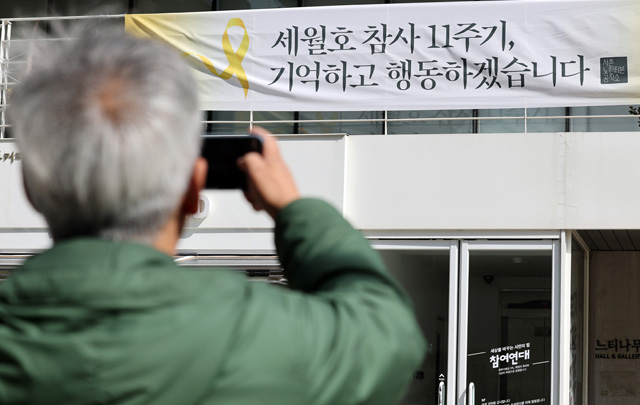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정부는 연공형 임금체계와 무임금 체계,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을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보고 임금 개편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의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의 작년 월 임금은 346만2000원을 기록했다. 3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 592만2000원 대비 58.4%다. 중소기업 임금과 대기업 임금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이 비율은 2018년 56.9%였다. 2020년 60.9%까지 임금 격차가 줄었다가 2021년 59.4%, 2022년 58.4%로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우선 임금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임금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다(무체계 사업장)는 답변이 61.4%(100만9167곳)에 달한다. 소위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준다’는 것이다. 이 중 99% 이상이 종사자 100인 미만 사업장(100만8674곳)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만4527곳 설문조사 결과 인사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9.3%를 기록했다. 이는 동일한 방식의 2015년 조사(3만6781곳 대상) 비율( 4.1%)의 두 배를 넘는다.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공에 따라 임금에 오르는 호봉제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300인 이상 근로자 대기업 가운데 62.3%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임금 격차 확대를 그대로 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작년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고물가 탓에 임금 인상 효과마저 사라진 것이다.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을 제대로 된 임금체계와 직무성과급 확산으로 잡고 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같이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재열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첫 회의에서 “1970년대 시작된 호봉제 연공형 임금은 외환위기까지 완성된 제도”라며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장기근속을 촉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 격차 등)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