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마약 중독자라는 과거는 평생 새겨지는 주홍글씨와 같다. 한 번 중독자의 꼬리표를 달게 되면 ‘중독자는 희망이 없다’ ‘중독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편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싸늘한 시선은 중독자의 가족으로도 향한다. 자녀가 약물에 중독됐다는 슬픔과 아이를 잘못 키운 것 아니냐는 주변의 비난 어린 눈빛 속에서 스스로를 철창 속으로 가두는 가족도 부지기수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이런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희망 같은 존재다. 사춘기의 일탈로 마약을 시작해 무려 25년간 중독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약을 끊고 회복한 후 20년 가까이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고 있다.
“중독자 가족들도 자주 뵙는데 불안했던 눈빛이 제 앞에서는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말로 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이 전해지죠. ‘센터장은 우리 아들보다 더 오래 마약을 했는데도 지금은 회복도 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생각이 기쁘면서도 고맙습니다.”
지금이야 ‘재활 전도사’지만 중독의 삶을 벗어나기까지 쉽지는 않았다. 그는 마약 문제로 정신병원과 교도소를 번갈아 오가며 젊은 시절을 모두 탕진했다고 기억했다. 마약을 사려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돈을 빌릴 정도였다. 급기야 두 차례 자살도 시도했다. 희망 한 조각 없는 삶이 괴로워 자신을 살려낸 의료진의 멱살을 붙잡고 “살아봤자 마약 밖에 안 하는데 왜 살렸냐”며 분통을 터뜨린 적도 있다.
이런 그를 살린 것은 생면부지의 노숙인이었다. 약물과 당뇨로 완전히 망가진 몸을 차가운 땅바닥에 누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에게 어느 날 붕대를 감은 노숙인이 다가와 밥을 내밀었다고 한다. 박 센터장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고 날 챙기느냐는 오만한 마음에 식판을 내팽개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도 계속 내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두셨다”며 “결국 마지못하는 척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약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낸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길로 병원을 찾은 박 센터장은 평생 인정하지 않았던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도움을 구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독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스스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기에 회복은 빨랐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로도 입소 재활 시설에 제 발로 들어가 단약 노력을 이어갔다. 박 센터장은 “1년간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니 시설의 ‘생활지도사’를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나도 범죄자인데 내가 누굴 지도하는 게 어울리기는 하냐며 거절했는데 믿어줄 테니 한 번 해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시작했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다른 중독자를 돕는 일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매년 수백 명의 약물 경험자를 직접 만나 어떻게 하면 약물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를 매일 함께 고민한다. 또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자신의 회복 사례를 강의하는가 하면 초범인 마약 사범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치료·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박 센터장은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마약 한두 번 했다고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고 낙인을 찍어서야 안 될 일”이라며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보람 역시 과거 자신과 같던 이들이 새 삶을 찾는 걸 볼 때다.
“돌이켜보면 노숙자가 제 밥 한 끼 챙겨줬던 그 마음이 결국 나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비로소 그 빚을 갚는 것 같아 뿌듯하죠. ‘영덕아, 너 사람으로 잘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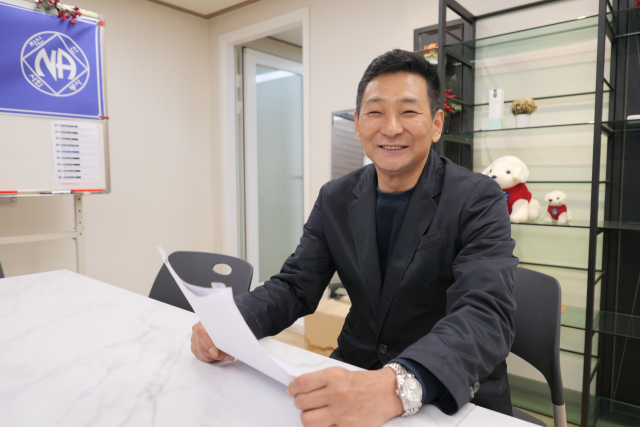

 kmkim@sedaily.com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