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후 혼수상태인 환자의 회복 경과를 간단한 혈액검사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윤준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송환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병원 밖 심정지 발생 후 회복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밖 심정지 후 목표체온조절 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혈청표지자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목표체온조절 치료는 심정지 환자의 심부 체온을 32~36°까지 낮춰 신경과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흔히 저체온치료라고 불린다. 최근 심폐소생술(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의 활성화와 더불어 목표체온조절 치료가 확대되면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진이 혼수상태인 환자가 다시 정상으로 깨어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연구팀은 입원 당시부터 입원 24시간 후, 48시간 후, 72시간 후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각 환자의 혈액을 수집한 다음 미세신경섬유경쇄(NFL·Neurofilament Light chain) 타우(Tau) 단백질, 신경교섬유질산성 단백질(GFAP·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UCH-L1 효소(ubiquitin C-terminal hydrolase-L1)를 측정했다.
이후 전통적인 바이오마커인 혈청표지자 NSE(Neuron-Specific Enolase), S-100B(S100 calcium binding protein)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혈청 바이오마커 곡선 아래 면적은 심정지 후 72시간 되는 시점에 가장 높았다. 특히 심정지 후 72시간째 측정한 NFL 단백질은 100% 특이성을 유지하면서 나쁜 신경학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높은 민감도(77.1%)를 나타냈다. 연구팀이 새롭게 선정한 4가지 바이오마커를 72시간째 측정하면 심정지 후 혼수상태인 환자가 다시 정상으로 깨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종전보다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혈청표지자라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교수는 “심정지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송 교수는 “심정지 환자의 예후 예측은 갑작스런 사고로 불안에 빠져있을 보호자들이 진료의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의료진은 물론 보호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중환자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크리티컬 케어(Critical Care’ 3월호에 실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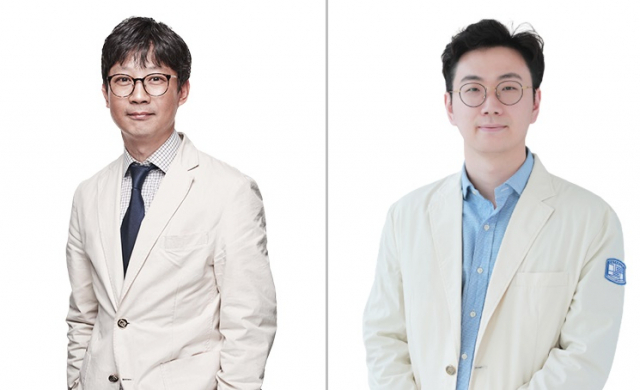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