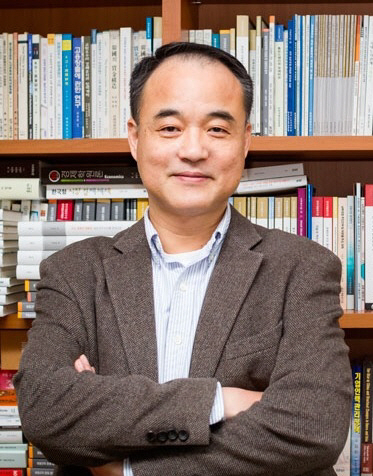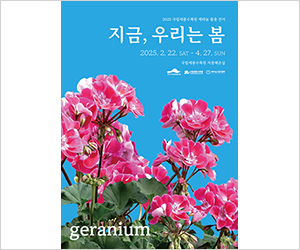청년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 등록금은 10년 이상 동결돼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들과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사립대들은 교수 충원도 어렵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등록금 규제가 이런 부작용을 감내할 가치가 있을 만큼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고 있을까.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고등교육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대졸자라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사교육은 더 늘어 가난한 학생일수록 대입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규제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대학 4년간 등록금은 최상위권 사립대도 3500만 원 수준으로 굳이 비교한다면 하버드대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과연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서 얻는 이득이 평생 4000만 원에도 못 미칠까. 이득에 비해 비용이 낮을수록 명문대에 가려는 학생은 많고 이 초과수요만큼 경쟁은 치열해진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등록금과 정원이 모두 묶여 있는 대학은 수능과 내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운다. 그 순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고 학원들은 점수 따기에 최적화된 교육으로 학부모 수요에 부응한다. 사교육을 줄여 보겠다고 입시를 이리저리 바꿔봤지만 초과수요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개편이 효과를 볼 리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6만 7000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초중고 재학 중에 지출되는 총 사교육비는 5285만 원에 이른다. 대학 졸업장을 위해 이 액수만큼 추가로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뜻인데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가난한 학생에게는 아무리 등록금이 낮아도 사교육비로 5000만 원을 넘게 써야 갈 수 있는 대학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이 없다면 등록금이 5000만 원 이상 비싸져도 가난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린다.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는 장학금이 없지만 등록금에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은 가난한 학생에게 진입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재원이며 청년층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다.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지나친 교육열 탓으로 돌린다. 물론 교육열도 한몫하지만 그런다고 등록금 규제의 폐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상위권 대학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입시 지옥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난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좌절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당장 현시점의 대학생들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적극적인 정부는 없었다. 현 정부에서도 인수위원회 시절 논의된 등록금 현실화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류에 맞는 화두이기는 하나 초중고 모든 과정이 과열된 입시 경쟁에 묶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데 그치고 말 우려가 크다.
입시 지옥을 강요당하고 대학 진학과 취업에서 좌절을 겪는 것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자녀 교육이 힘드니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르다던가. 이제라도 등록금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해 제대로 된 대학 자율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의 첫 걸음이고 청년층을 위하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