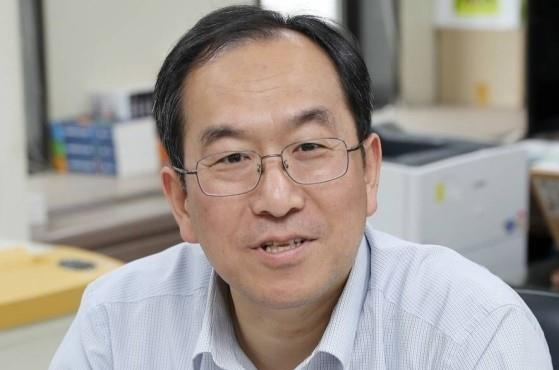‘대대로 독립운동가가 많아서 환자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출근에 분주한 지하철역 안에서 이런 문구를 앞에 두고 동정을 호소하시는 할머니가 요즘 자주 눈에 띈다. 80세쯤 되셨을까. 무슨 사연이 있으시기에 저런 문구를 적어놓고 계신 것일까.
오래전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친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파의 후손들을 만나거나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이완용의 후손들이 누가 있고,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사례가 쌓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비교해서 이상한 점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부자 동네에 사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유가 뭘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교육이었다. 친일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후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켰다. 그것이 후손들을 여전히 사회 지도층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으로 남아 있게 한 비결이 됐던 것이다. 반면 독립유공자들은 가진 재산을 독립운동에 모두 쏟아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다 보니 자손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후손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많았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본래 호국(護國)과 보훈(報勳)은 다른 말이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대해 보답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부르는 이유는 뭘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호국이 곧 보훈이고 보훈이 곧 호국이기 때문이다.
보훈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나라에서 그런 나를, 내 후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달 6월 5일, 정부 수립 75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탄생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됐다가 62년 만에 비로소 어엿한 정부 부처로 인정받은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단순히 부 승격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는 보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지하철역 할머니와 같은 문구를 내걸고 동정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