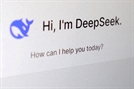"원청업체가 사업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 건 참 드문 일이죠."
28일 오전 8시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선박업체 유일의 1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줄을 서 묵념을 했다. 이들은 7월 3일 선반 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A씨의 '마지막 퇴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하청업체 직원 A씨는 2003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 아버지도 서울에서 건설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대를 이은 산재의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원청업체인 유일과 하청업체 모두 A씨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유족에게 약속했다. 두 회사 대표는 사과문에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안전한 현장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사고 당시부터 함께 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사고는 조선업 대단계 하도급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처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상황을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은 도급 형태 특성 상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노동계에서는 대부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다며 비판해왔다. 노동계가 원·하청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