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9·10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국경분쟁, 개발도상국 리더십 경쟁, 점점 엇갈리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중국이 G20을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응하는 구도에 적극 활용해오면서 과거 G20 정상회의마다 시 주석이 빠지지 않고 직접 참여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이와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G20의 주역이었지만 올해는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정상회의 불참이 드문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로이터통신은 “내부적으로 시 주석의 불참을 자신들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들어 정치·경제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진 국경분쟁이다. 양국은 2020년 5월 판공호수 난투극, 같은 해 6월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등으로 대립해왔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공식 표준지도에서 인도가 실효 지배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중국이 지배하는 악사이친고원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기해 인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도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국 관계가 해빙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올 1월 화상으로 연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중국 중심의 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7월 주최하며 화상회의로 진행해 김을 뺐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은 컴퓨터, 철강, 우주탐사, 첨단 기술 등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노골화하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불편하다. 인도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바이자얀 판다 대변인은 시 주석의 불참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언짢은 시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며 “자신들이 지난 4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이었지만 지금은 인도에 그 자리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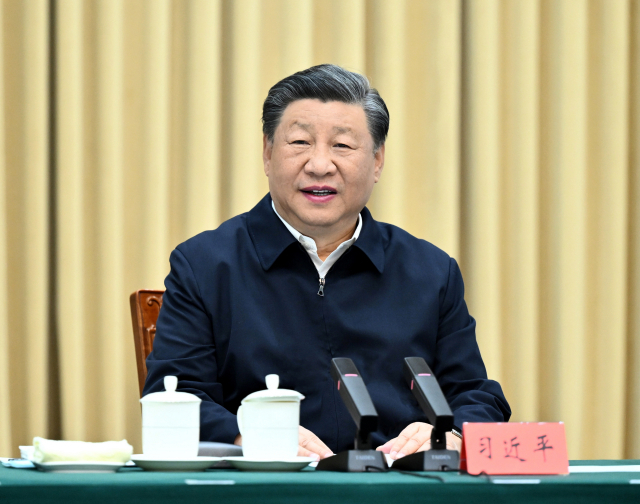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