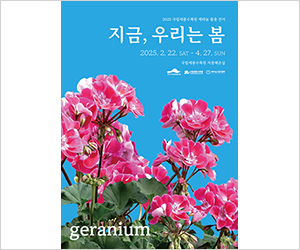인류에게 ‘도시’ 만큼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많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메가시티’ 논쟁을 불러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도시는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일까. 도시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자 온갖 문제들의 시발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을 통한 새로운 도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언 골딘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필진인 톰 리-데블린이 함께 쓴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원제 Age of the city)’는 도시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 책이다.
책에 따르면 도시 자체 존재의 불가피성은 역사가 말해준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 4대 문명은 곧바로 도시 문명이다. 기원전 3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 도시가 등장하고 이후 아테네·로마 등 도시국가를 거치면서 도시는 곧 문명과 동의어가 됐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 문화도 꽃피웠다.
최근 들어 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그 비중이 인류의 생존 문제를 규정할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도시에는 세계 인구의 5%만 살았으나 오늘날에는 55%가 살고 있다. 앞으로 더 확대돼 2050년에는 3분의 2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면서 또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시에 전기나 수도 같은 사회적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농촌보다 월등한 삶을 향유할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있고 또 축적된 자본을 통해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영국 맨체스터, 미국 뉴욕, 중국의 상하이 등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도시를 통해 이뤄졌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넘쳐난다. 도시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이는 인류가 맞이한 가장 치명적인 악재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혜택은 소수에게 가고 다수는 나쁜 일자리에서 근근히 살아간다. 불평등의 심화는 트럼프 등 극우포퓰리즘의의 대두를 가져왔다.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이 산업화되면서 도시의 발전을 이뤄냈다면 인도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단순히 농촌의 어려움때문에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실정이다.
또 도시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취약하다. 이 중에서 코로나19가 중국의 거대 도시에서 발생해 주요 도시를 거쳐서 세계 인구를 감염시킨 점을 특히 강조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은 도시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인류 진보의 엔진이었던 도시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이를 위해 지식경제 사회에 맞게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성장 엔진인 젊은 지식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매력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격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두루 취하는 방식에 따라 도시도 복합용도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사무실과 아파트 등 주택이 함께 있어야 한다. 또 교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함께 다양한 작업장과 유통단지 등의 균형잡힌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크게 줄이고, 대신 대중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엮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유한 지역이건 가난한 지역이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교육 재정도 확대돼야 한다.
저자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제조업의 흥망을 겪은 도시가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국 우리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1만 88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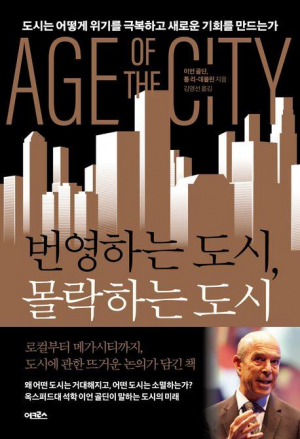
 chsm@sedaily.com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