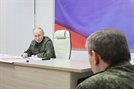강황으로 염색한 노란색 직물이 커튼처럼 전시장 통유리를 가리고 있다. 미술관 앞 골목을 지나가던 관람객은 ‘이 미술관이 전시를 준비 중인 건지’ 혹은 ‘전시를 끝낸 건지’ 궁금해 하며 문을 열어본다. 문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은 도시에서 좀처럼 맡아본 적 없는 정체 모를 구수한 냄새. 관람객은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를 따라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본다.
장막처럼 축 늘어져 있는 직물을 걷어내면 옹기와 짚, 삼베와 밧줄이 서로 얽혀 있는 광경이 보인다. 흙더미에는 불규칙하게 새싹과 버섯 종자가 심어져 있고, 옛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국화가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커다란 옹기도 보인다. 옹기 속에는 쌀과 누룩이 담겨 있다. 관람객들은 그제서야 입구에서 맡았던 냄새의 정체가 누룩과 질척거리는 흙, 국화에서 풍겨 나온 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16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계 브라질 작가 댄리(36)의 한국 첫 개인전 ‘상실의 서른 여섯 달’의 설치 풍경이다.
댄 리는 흙, 꽃, 버섯종자 등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작업하는 설치미술가다. 자연의 재료는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버섯종자, 누룩 등은 발효와 부패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한다. 전시가 지속될수록 작품의 내용과 모습도 바뀌는 셈이다. 작가는 이같은 재료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비인간적인 주체’와 협업해 전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변화 중 일어나는 부패와 발효는 작가에게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요 주제다.
작가는 전시를 위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짚풀공예 장인,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들에게 발효와 도예, 죽음과 전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수집했는데,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3년상’이라고 불리는 장례 문화에 큰 영감을 얻는다. 오랜 시간 죽음에 관한 의식을 연구한 작가의 과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가 작가의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되는 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작가는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3년상 문화를 알게 됐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애도를 전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천장에 조명처럼 설치된 ‘애도의 꽃’ 국화는 전시 기간 교체되지 않는다.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흙으로 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새싹과 버섯 포자에서는 싹이 날 수도 있다. 노랗게 염색한 직물은 전시 기간 햇볕을 받아 탈색될 것이다. 옹기 속 누룩은 발효돼 막걸리로 다시 태어난다. 이들 ‘비인간 행위자’들은 전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작가는 이를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유일한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애도는 마무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인지 전시장에는 슬픔보다 새로운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진다. 마치 새싹이 피어나는 봄의 흙냄새처럼 옹기와 지푸라기, 꽃이 모두 하나가 되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하다. 전시는 5월 12일까지 열린다. 앞으로 3개월 여간 ‘비인간 행위자’들은 어떻게 변화할까. ‘N차 관람’이 더 기대되는 전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se@sedaily.com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