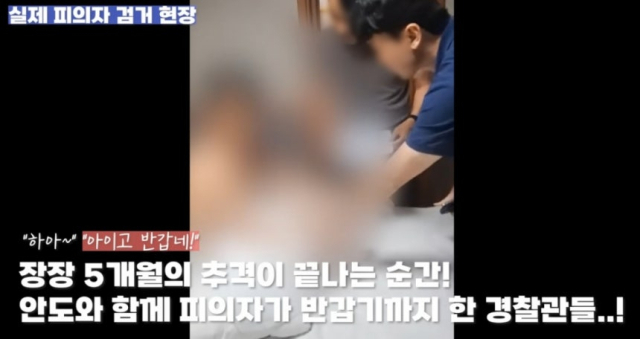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에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 출생 시 대출 탕감 등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의 남발은 또다른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소득 상위층에서 출산율이 소득 하위층보다 높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감소 폭이 작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계돼야 함을 의미한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아동 수당 등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보편적 현금 지원 형태로 시행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현금 지원은 소득 상위 20~40% 구간에만 효과가 있을 뿐 그 이하의 소득 계층이나 최상위 소득 계층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미 다른 분위보다 출산율이 높은 최상위 소득 가구에 소규모 현금 지원이 추가적인 출산 유인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중·저소득 가구에도 현금 지원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이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이동성이란 소득분포상 개인의 위치가 변화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득 이동성이 높을수록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그대로 대물림되지 않고 금수저와 흙수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기 쉬운 사회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일찌감치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자녀가 평생 누릴 삶의 가치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역설한 바 있다.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지원받아도 자녀가 부모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소득 이동성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인식은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2년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7.8%는 개인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했으며 61.6%는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세대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득 이동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교육이다. 하지만 높은 사교육비 부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향도 낮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부가 4월 발표를 예고한 소득 이동성 제고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효과를 낼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