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퇴출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타깃은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만들고 일부 주 정부가 사용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금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다.
법안은 ‘적국이 통제하는 앱에 대해 배포, 유지 보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틱톡처럼 덩치 큰 플랫폼 사업을 6개월 안에 매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틱톡 퇴출을 이끌고 있는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이 틱톡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재임 시기 틱톡 사용금지령을 내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틱톡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에 동의하지만 사용금지를 지지할 수는 없다”면서 “페이스북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선거 자금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주주이자 공화당 후원자인 억만장자 제프 야스와 만난 뒤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돈 앞에서는 정치적 입장도 쉽게 바꾸는 ‘트럼프다운 행동’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전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최근에는 ‘틱톡 금지법’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거부권 없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틱톡 계정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젊은 유권층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캠프 틱톡 공식 계정에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는 틱톡이 필요하다’ ‘틱톡을 지켜라’ 등의 틱톡 퇴출을 반대하는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중국 공산당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상 위험이 크다는 점이 틱톡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미국을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도전하는 전·현직 대통령에게서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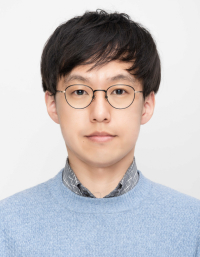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