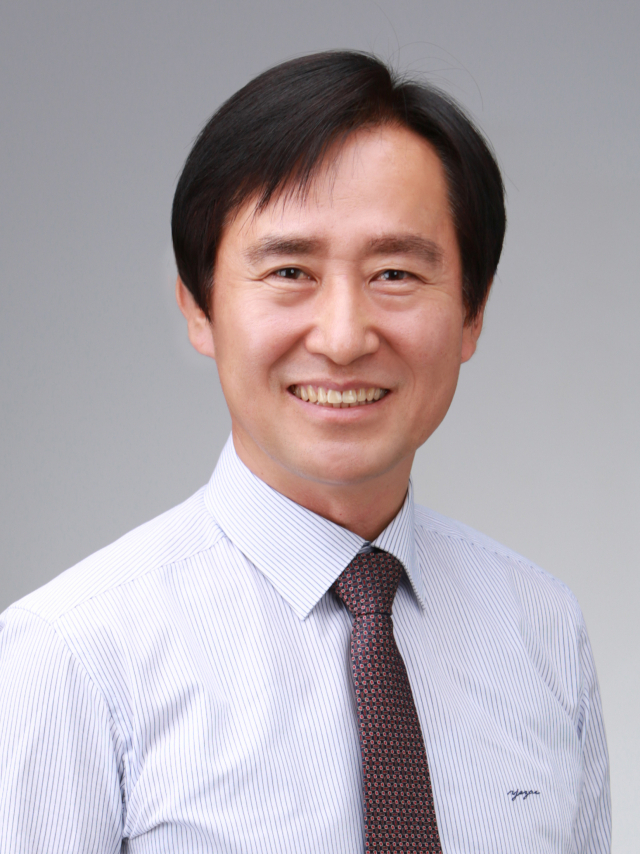지난달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합의해 차세대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인 ‘유로7’을 확정해 발표했다. EU가 2022년 말 내놓은 강력한 유로7 초안에 비하면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배기 규제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유로6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시험 방법이 까다로워지고 가솔린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증발분과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나오는 입자상물질은 추가됐다. 트럭·버스와 같은 대형 상용차에 대한 규제는 제법 강화돼 어쩔 수 없이 상용차의 배기 후처리 장치의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암모니아 규제가 도입된 것도 특기할 일이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유로7 규제가 초안에 비해 완화돼 자동차 회사의 부담을 덜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유로7 초안은 강력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미세먼지 포함) 규제치를 예고하며 내연기관차의 목을 죄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강력한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규제치 논의의 방향이 달라졌다.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 교통장관이 만나서 당시 예고된 유로7은 비현실적인 환경 규제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탄소 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이 결국 통했다.
금방 사라질 것 같던 내연기관차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EU의 이런 결정을 유발한 계산과 분석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 많다. 애초에 예고된 강력한 유로7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전기차로 갈아타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계속 타게 돼 질소산화물 저감이 4%에 그치는 반면 유로6 규제를 유지하면 중고차가 신차로 바뀌는 비율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질소산화물이 80% 줄어든다는 분석이 그 한 예다.
이렇듯 실용적인 판단을 내린 데는 과거 경험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승용차의 임의 설정에 따른 배기 규제 위반으로 디젤차량이 시장에서 줄어들자 디젤 신차를 구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도리어 중고차를 많이 사용하면서 유럽에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이 더 심해졌던 사례가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승용디젤차가 가솔린차로 대체되면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평균 차량 크기가 커지면서 이 경향은 아직도 악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배터리 전기차가 그만큼의 대체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 전기의 탄소 중립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유로7 규제는 계산을 통한 실용적인 결론을 내린 셈인데 그나마 상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주행거리와 수명이 긴 대형 상용차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전기차의 안전·내구·인프라·경제성 등에 숙제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유로7 규제 설정은 명분과 이상보다는 실질적인 친환경, 탄소 중립의 경로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면모를 보인 것이라서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