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삶아서는 안 된다’
2021년 12월 영국에서는 척추 동물에만 적용되던 동물 복지 및 보호를 문어, 오징어를 비롯해 게, 바닷가재 등과 같은 갑각류 무척추 동물로 확장하는 내용의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다뤄져 화제가 됐다. 이는 영국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2012년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선언’을 통해 과학자들은 많은 동물이 의식을 지닌다는 사실을 지지했다. 이 선언을 채택한 국가는 지난해 기준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등 32개국에 달한다.
지난 10년 간 동물이 지각 능력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지게 된 데는 반 세기 동안 동물행동학 한 분야를 파고든 과학자의 역할이 컸다.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 명예교수이자 동물행동학자인 마크 베코프의 주된 연구 대상은 동물의 마음과 행동이었다. 그는 동료 과학자들의 냉소를 견디며 동물들이 감정을 느끼는 사례들을 수집했고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번에 국내에 첫 출간된 ‘동물의 감정은 왜 중요한가(원제 :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는 2007년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출간 당시만 해도 도발적인 책이었으나 지난 17년 사이에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재평가를 받게 됐다.
저자에 따르면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혐오, 공포, 놀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놀라며 두려워하는 감정인 경외심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침팬지들의 ‘폭포수 댄스’를 예로 들면 침팬지들은 폭포수 바로 아래 가까이서 두 발로 일어나 리듬을 타면서 발을 이리저리 옮겨 몸을 흔들며 10~15분 가량 춤을 춘다. 장대비가 쏟아지든, 격한 돌풍이 일어나든 그들은 춤을 춘다. 이를 두고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신호로 해석하며 “폭포수 댄스가 종교 의례의 형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애도와 슬픔도 인간만의 영역은 아니다.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가 죽었을 때 주검을 어루만지는 의식 끝에 주변의 땅을 파내 흙을 뿌려 작은 봉분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어와 봉분 위에 놓는다. 밤을 지새우며 무덤을 지키던 코끼리들은 새벽에 자리를 떴다. 한 연구팀은 코끼리들이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애도의 감정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
사랑은 어떨까. 인간은 동물의 짝짓기에 대해 종족 번식의 본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사랑의 감정을 배제하지만 사실 동물 역시 인간처럼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랑을 하는 존재다. 많은 포유류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한다. 조류 및 파충류는 메소토신을, 어류는 이소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사랑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짝짓기 상대를 택할 때 저마다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 조류의 90%는 한 번에 한 상대와 관계를 맺으며 일생 동안 동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도 관측됐다.
저자는 동물의 지각 능력과 감정 유무를 인정하는 것은 급진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제 할 일은 동물에 대한 이해 만큼이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물 복지를 넘어 동물의 웰빙을 지향하며 동물에게 기본적인 생존권과 법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동물에 대해 지칭하는 말이나 쓰는 단어부터 바꿔야 함을 뜻한다. 그는 전염병이 든 가축을 폐사시킬 때 ‘제거’ ‘소각’ 등의 단어를 쓰는데 이는 살해라는 심각성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종 차별’이라는 것이다.
영국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시키며 동시에 ‘동물 감각성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정책이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에콰도르에서는 동물에게 생존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일로 여겨지지만 한번 인식이 바뀌면 빠르게 방향 전환할 수 있다. 이미 물 밑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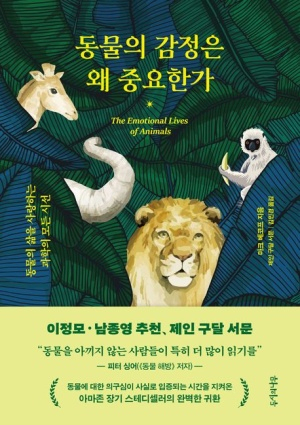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