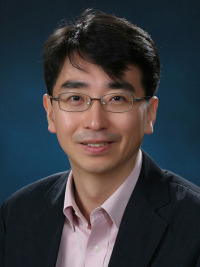거의 모든 이슈에 견해 차이를 보이며 다투기만 하던 정치인들이 20대 남성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병 처우 개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드디어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205만 원까지 오른다. 병역의 의무만 강조하며 입혀주고 먹여주고 운동까지 시켜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든다.
그런데 병장 월급이 1991년 1만 원에서 2011년 10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는 2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빠르게 상승한 사병 월급에 비해 거의 제자리걸음만 하는 군 간부의 월급이 군 복무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에 큰 변화를 줘 군 인력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군 전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5년부터 기본급(150만 원)과 자산 형성 지원금(55만 원)을 합친 병장 월급은 205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로 가정할 때 내년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194만여 원, 하사 1호봉은 193만여 원에 그친다.
물론 소위와 하사들은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겠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초급 간부나 기본급이 면세인 병장이나 거의 같은 돈을 받는다. 의무 복무 기간이 더 길고 여러 가지 책임이 따름에도 상대적인 보수 격차는 큰 폭으로 줄면서 초급 간부를 지원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유인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2020년 44.1 대 1에서 올해 28.9 대 1로 감소했고, 올해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1.7 대 1로 8년 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됐다. 부사관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올해 입대한 하사는 전역한 부사관의 40%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하사관이 주로 조종하는 1100대의 K9 자주포 중에서 300대가 조종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 1위의 저출산율로 병력자원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 간부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군의 보수 체계는 군 간부의 양성이 힘든 쪽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현재 사병만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을 임관 2년차 이하인 장교와 부사관들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유인체계의 변화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어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세기 호주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선장들과 계약을 맺고 죄수들의 이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했다. 이송비를 미리 받은 선장들은 이송 도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국에서 호주로 이동하는 동안 정원보다 많은 죄수들을 싣고,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위생 문제 해결을 등한시했다. 그 결과 영국에서 출발해 호주에 무사히 도착한 죄수의 비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죄수들은 이송 중에 사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선장들에게 이송비를 미리 주지 않고 배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의 수에 비례해 이송비를 주는 것으로 유인체계를 바꿨다.
유인체계의 변화는 정원만큼 죄수를 태우고 죄수들에게 깨끗한 위생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선장들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었고 그 결과 40%에 그치던 죄수들의 생존율은 98%까지 상승했다. 이 예는 겉보기에는 인명 경시, 위생 문제 같았던 죄수의 이송 문제가 처음에 잘못 설계된 유인체계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로 재래식 전투로는 대한민국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은 핵무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중동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같은 불안정한 세계정세 변화에 강한 국방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된 국방예산에서 대한민국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때 유인체계 설계를 위한 정부의 목적함수는 20대 남성들의 환심을 사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 전력 극대화가 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