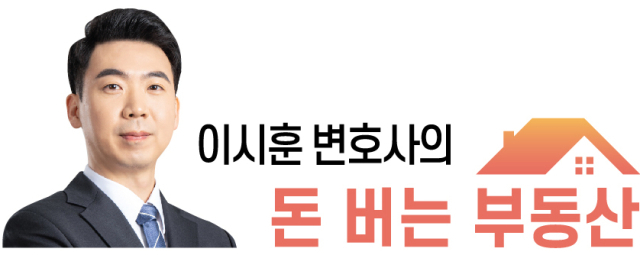서울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 지난 11월 감정가 8억원의 아파트가 1회 유찰되어 20%가 저감된 6억 4000만원의 최저가격으로 매물로 나왔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확인한 호가는 감정가와 비슷한 8억원이었고 실거래가도 7억원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최저가격 수준으로 입찰하면 1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었다.
입찰이 이루어진 날, 총 2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첫 입찰자는 최저가인 6억 4000만원을 썼다. 첫 입찰자가 입찰 가능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썼기에 다른 입찰자는 얼마를 써도 무조건 낙찰을 받는 상황. 과연 1등을 한 입찰자는 얼마의 입찰가를 썼을까?
1등의 입찰가격은 670,000,000,000원이었다. 무려 6700억원을 입찰가로 썼다. 아마도 1등은 6억 7000만원의 입찰가격을 쓰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입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 자릿수를 착오하여 0을 3개나 더 써냈다. 원래 생각한 입찰가보다 무려 1000배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6700억원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경매입찰법정 내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실수를 인지한 낙찰자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우는 소리로 사정해보고, 숫자를 잘못 써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에 낙찰을 취소해달라는 서류도 내어본다. 그 누가 봐도 실수임이 명백하지만 입찰서의 숫자를 잘못 써낸 것은 자신이 한 실수이므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낙찰자는 자기가 실수로 쓴 입찰가격에 구속되며 6700억원의 가격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가 위 돈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매각대금 납부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낙찰자가 입찰 당시에 납부하였던 입찰보증금이 몰수되고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이 경매 사건은 최저가격이 6억 4000만원이었으므로 그 가격의 10%인 6400만원이 입찰보증금이다. 이 입찰보증금은 경매법원이 몰수하여 배당재원에 포함시킨다.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권리분석’과 ‘명도’이다. 그런데 권리분석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꾸준히 공부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으며, 명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협의로 잘 마무리된다. 경매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겁먹을 일이 없는 것이다.
다만 경매에서는 권리분석과 명도보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실수 없이 입찰표를 작성하는 일이다.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특히 ‘입찰가’ 부분을 잘못 쓰면 그 대가가 만만치 않다. 입찰가는 마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
입찰자가 입찰가를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은 모두가 알지만 공정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법원 입장에서는 ‘6700억원’이라 쓰여진 낙찰가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그 돈을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몰수당했다. 만약 낙찰자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6억 7000만원의 가격에 낙찰받아 호가보다 약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64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경매를 직접 해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왠지 어려울 것 같은 권리분석이나 명도도 생각보다 쉽다. 의외의 복병은, 위 사례처럼 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다. 이 경우는 입찰자가 실수로 0을 3개나 추가로 붙였지만, 보통은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도 최고가 입찰이 되어 낙찰자가 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곤 한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웬만하면 원금을 잃을 일이 없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입찰시 입찰가격을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공부를 잘 끝내고 정작 시험에서 답안지를 밀려쓰면 안 되는 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