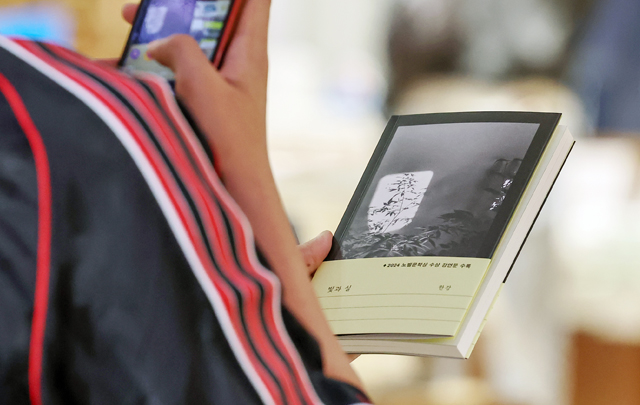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위기에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없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허를 찔리자 일각에서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마저 나온다. 옛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첫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처럼 후발 주자가 기술 우위국을 앞지른 순간을 뜻한다.
중국이 미국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격화는 불가피해졌다. 취임 직후 AI 인프라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에 대해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과감한 AI 규제 철폐와 대중(對中) 추가 제재 등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기술 전쟁이 불붙고 있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AI 시장에서 미중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시시각각 한국과 기술 격차를 좁혀가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위기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정쟁에 막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술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가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글로벌 AI 3강’ 구호만 외치는 사이에 미중 AI 기술력은 이미 한참 앞서갔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3강’ 목표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다가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는 ‘모멘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 생존이 AI·반도체 무한 경쟁의 승패에 달렸다. 기업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에 사활을 걸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노조도 공생을 위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신속한 입법 등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