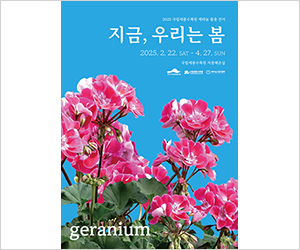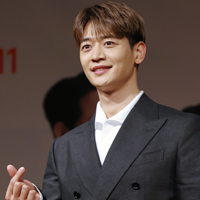요즘 부쩍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현재 시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5000만 명이 넘는다. 이 정도 규모의 국민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사례로 드는데, 스위스 인구는 800만 명이 조금 넘는 소규모다. 게다가 스위스는 철저한 연방제 국가다. 우리나라는 연방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인구 규모와 연방제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를 빈번히 실시해야 하는데, 재정적 측면이나 행정적 차원을 고려하면 연방제를 하고 인구가 적어야 빈번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스위스의 평균 투표율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렇듯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은 너무 잦은 투표 때문인데, 이 정도 낮은 투표율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 사안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막강한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 국민들 중 상당수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국민은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큰 목소리를 여론이라고 주장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소수를 ‘과대 대표’하게 만드는 행위다. 즉 인터넷 여론을 일반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멕시코 출신의 정치학자 벤저민 아르디티 교수는 “SNS와 같은 매체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인민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쪽으로 밀려나고, 무대에는 선동 정치에 강한 포퓰리스트들이 자리 잡게 되는 현상이 현대사회에 자주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런 이론을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주장은 이런 청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모바일 투표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평등·비밀·직접 원칙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방식이다. 결국 인터넷 이용을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소수의 진영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여론으로 둔갑시키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용주의는 ‘일반적 실용주의’가 아닌 ‘진영을 위한 실용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순되는 주장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