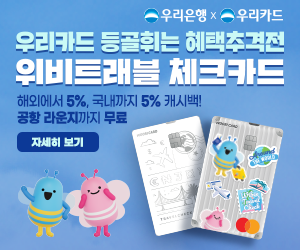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아부 외교’가 화제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항’ 대신 ‘아부’를 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에 대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TV에서 본 유명인을 직접 만나게 돼 기뻤다”면서 “무섭고 강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우 진지하고 강력하며 미국과 전 세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껏 치켜세웠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귀에 걸렸고, 회담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부’라는 단어를 중립적 의미로 사용했다.
국제무대에서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다. 칭찬을 마다할 정치인은 없기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유효한 외교 수단이다. “일본에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사랑해요”라고 했다니 아부 외교는 남는 장사였다. 외신과 달리 국내언론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수사를 다소 부정적 뉘앙스로 전했다. 동일한 사안을 전하면서도 일본 이슈라면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보는, 국내 정서를 뛰어넘지 못한 관성에서 비롯된 보도였다. 정도를 넘어선 외교적 수사는 자칫 굴종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의 ‘아부’는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라는 점에서 많은 걸 시사한다. 일본 외무성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을 지난해 12월 마러라고에 보내 트럼프와 대화 물꼬를 열었다. 이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통해 1,000억 달러(약 145조원) 투자 선물 보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사꾼 트럼프를 효율적으로 공략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황금 투구 선물 또한 면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다. 투구를 제작한 곳은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돗토리 현이고, 주문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니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상 외교가 멈춘 한국 상황에서 일본이 대미 관계를 선점한 건 아픈 대목이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실리외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공부 모임을 갖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무상을 지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물론 외무성·경제산업성 간부들과 함께 ‘트럼프 식 맞춤형’ 문답을 만들고, 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표로 정리해 제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설득됐는지는 몰라도 향후 미일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자세를 낮추는 일본 외교는 일본인 특유의 치밀함을 반영한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도 마다하지 않는 사무라이 문화를 미덕으로 삼는 일본에서 아부는 계산된 행동이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 있다가 권력을 손에 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화가 상징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겨울날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고 있다가 따뜻한 신발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사회에서 아부가 아닌 미담으로 회자된다. 히데요시의 행동은 주군을 위한 충성이며, 훗날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은 이유마저 여기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니 진영을 떠나 이시바 총리의 언행을 시비할 일본인은 없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패전 이후 빛을 발했다. 미군정하에서 시게미쓰 마모루 외무상은 맥아더 극동사령관의 비위를 맞춰 미군 직접통치에서 간접통치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경제 부흥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일본은 미국과 코드를 맞춰 정상국가로 이행이라는 실리를 취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1951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뒤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고 경제부흥에 집중하는 ‘요시다 노선’을 1980년대 초까지 견지했다. 이런 기조 아래서 이케다 수상 재임 당시 일본 경제는 9~10%대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GATT와 IMF, OECD에 가입하며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패전 19년 만인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지 치른 배경에는 스스로를 낮춘 외교가 있었다.
일본이 록펠러센터와 콜롬비아 영화사를 매입하고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일본 때리기에 나서자 일본은 다시 엎드렸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이어 1985년 ‘마에다 리포트’를 토대로 10년 간 430조 엔에 달하는 재정지출과 미국 내수 시장 확대를 뒷받침했다. 또 경제구조를 바꾸고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따랐다. 당시 협상 항목만 200개에 달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일본은 힘의 역학 관계를 인정하면서 보통국가로 보폭을 넓혔다. 이 결과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던 국가안보에서 벗어나 자국이 공격 받거나 동맹국이 요구하면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보통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일본 외교는 철저하게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트럼프를 추켜세울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했다. 나아가 정적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방식까지 수용했다.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아부라고 폄하할 일도 아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는 일본 외교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 한국 정치를 돌아보게 한다. 과시용 허세를 내려놓고 국익을 위해 아부를 자처하는 일본 정치를 주목한다.
/서경IN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