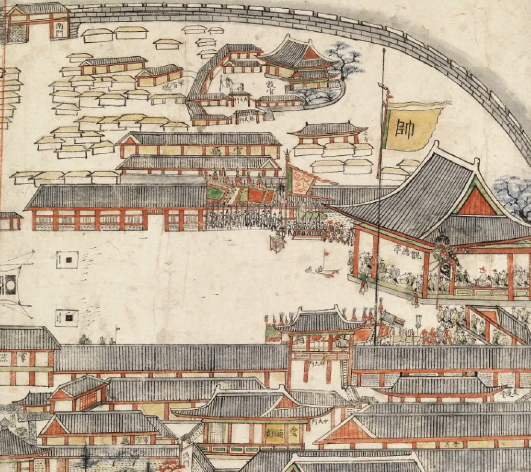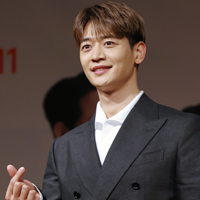지난번에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 제주 목사 이기빈의 졸기에 삽입됐음을 언급했다. 유구 왕자가 살해됐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소문은 오랫동안 제주인들에게 정신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1770년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인 장한철은 1611년 유구 왕자가 제주에서 살해됐다는 일(소문)로 인해 유구인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해 ‘제주’를 알 수 있는 각종 물품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출신지를 전라도의 연해 지역으로 사칭했다.
그런데 이기빈이 사망한 지 4년 뒤인 1629년(인조 7년) 음력 8월 13일 인조는 제주인에 대한 육지로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를 알려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육지의 고을로 떠돌아 이동하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축되자 비변사가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上)이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군역을 담당할 성인 남성 인구가 부족해졌다는 것인데, 해결책이 좀 이상했다. 군역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섬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다니. 제주도에 대한 ‘출륙 금지령’의 이유다.
바다로의 어업이 생계 수단인 제주에 남성 인구가 적은 것은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삼다(三多)로 유명한 제주에 여성 인구가 많은 것은 남성 인구가 해상 활동 중 사망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군역 부족을 해결하려면 제주로의 이주를 장려하거나 강제로 군역 담당자를 보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제주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비상식적 조치에는 그만큼 급박하면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법이다. 4년 전 등장한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출륙 금지령’을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소문과 사건의 배후에는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과 그 직후부터 명과 유구 (및 일본) 사이에서 조선이 직면했던 외교적 곤경이 숨어 있었다.(계속)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